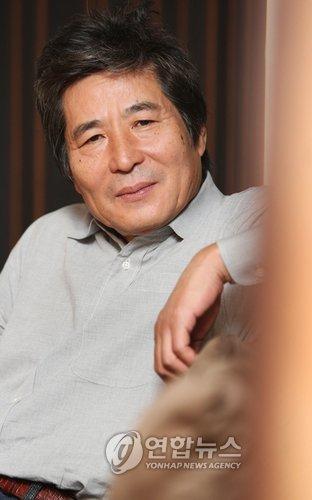(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 중견 감독 오구리 고헤이(63)의 작품들은 보기 쉬운 영화는 아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고요하며 정적인 작품들이다. 그의 카메라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이나 자연의 풍경은 흔치 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그가 만든 화면은 경망스럽지 않게 존재와 세상을 담고, 그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며, 보는 대로 느끼게 한다.
6일부터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는 오구리 감독의 전작전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겨우 다섯 편. 데뷔 이후 27년간 다섯 작품만 내놓은 그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으로 꼽히는 것은 다른 영화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과 화법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전 참여와 함께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서울을 찾은 오구리 감독을 6일 만났다. 그는 다양한 비유와 철학적 표현을 섞어 가며 영화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했다.
"사람을 찍을 때 말하는 모습을 우선 찍을 것인지, 표정과 모습을 찍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란 드라마를 추구하므로 갈등을 담으려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갈등은 그렇게 쉽게 표출되지 않죠. 무엇을 느끼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갈등을 그려야 하는데 상업영화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관객이 영화를 관람할 때 '본다'와 '느낀다'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보는 이들이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때의 느낌이란 시각적 자극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감각을 일깨운다는 뜻이다.
"저기 창 밖에 있는 산을 봅시다. 우리는 '저 산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이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산의 존재를 알죠. 논리가 아닌 개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희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시작과 끝의 과정을 분명하게 알기보다 희미하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게 아닐까요?"
그의 영화들은 일본적인 풍경과 일본인들의 삶을 짙게 담고 있지만 서구 유력 영화제에서 사랑을 받아왔다. 데뷔작 '진흙강'(1981년)으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2등상을 받았고 '가얏고를 위하여'(1984년)로는 프랑스 조르주 사둘상, '죽음의 가시'(1990)로 칸 영화제 그랑프리, '잠자는 남자'(1996년)로 몬트리올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적 문화를 유럽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서편제'가 칸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을 때 임권택 감독님께 '그래도 내게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다, 유럽인들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다만 제 작품들은 운이 좋아서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가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오구리 감독은 한국과 유독 인연이 깊다. 2번째 영화인 '가얏고를 위하여'는 재일교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토대로 만들었고 4번째 영화 '잠자는 남자'에는 안성기를 주연 배우로 썼다. 한국의 수많은 감독들과 교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내도 재일교포다.
그는 1981년 데뷔작을 상영할 때 극장에 찾아온 동갑내기 이장호 감독을 만나면서 한국 영화인과의 인연을 맺었다. '가얏고를 위하여' 때 임권택 감독과 만났고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으면서 박광수, 이창동 감독 등 한국 감독들과의 관계를 더 넓혔다.
"우스운 얘기지만 일본 감독들이 무슨 작품을 만드는지 관심이 없어도 이창동 감독, 박광수 감독이 다음에 뭘 만들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웃음)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를 봤을 때는 깜짝 놀라 자극을 받기도 했죠."
이번 아시아나 단편영화제에서의 심사기준에 대해 그는 "영상이 가진 힘을 한순간에 표현하는 것"을 꼽았다.
"단편영화는 장편보다 자유로운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니 순간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성이 가미됐는지도 봐야겠죠. 이번 영화제를 통해 장편의 힘을 뛰어넘는 단편 작품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이번 전작전에 대한 소감으로는 "일본 문화 개방이 10년째라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다양하고, 일본을 깊이 보여주는 작품들이 소개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문화 교류의 공백이 50년입니다. 이 공백을 일부 상업 영화들로만 메우기는 어렵죠. 이렇게 제 모든 작품들을 한국 관객들과 마주보게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cherora@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