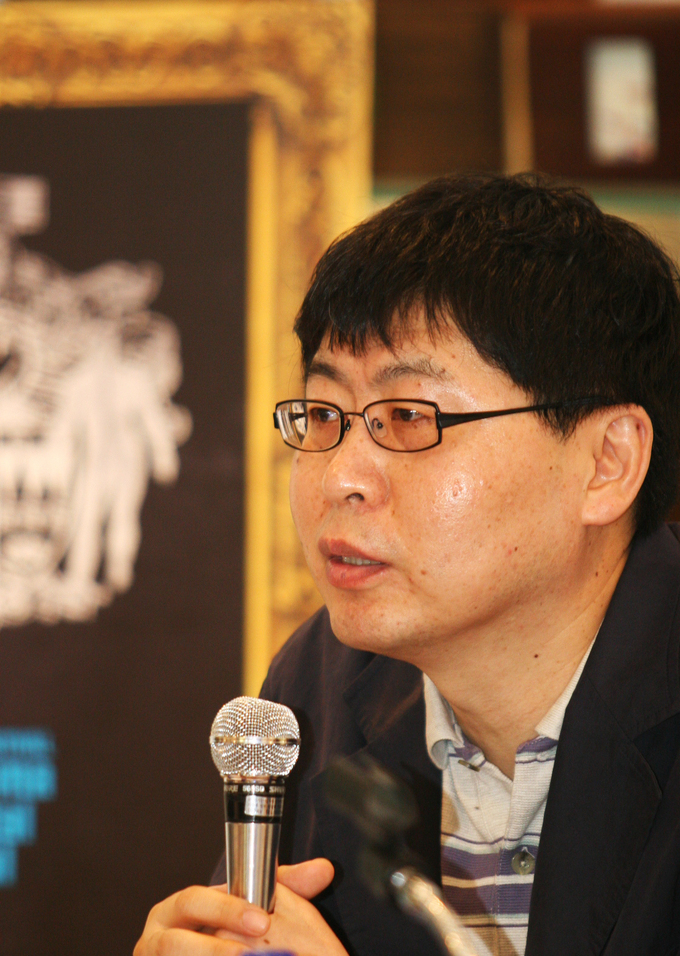정성일, 박기용, 필립 치아, 이치야마 쇼조, 리척토(왼쪽부터)
정성일, 박기용, 필립 치아, 이치야마 쇼조, 리척토(왼쪽부터)
정성일 공동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국에 국제영화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8년 전에 전주국제영화제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부산이 있는데 왜 또 전주가 있는가 라고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똑같다. 개인적으로 영화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제는 더 많은 재능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 전주, 부천 등 이미 많은 영화제가 있다. 하지만 1개 영화제가 1천편을 상영하진 않는다. 각 영화제는 나름의 성격에 맞게 영화를 선택할 것이고, 어떤 영화는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작품은 아니다. 각각의 영화제가 서로 다른 원칙과 컨셉과 태도와 비전을 갖고 영화를 선택한다면 그들이 놓친 영화에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영화에 그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왜 디지털 영화제인가. =디지털은 그동안 새로운 재능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 2회 전주국제영화제 때 나를 놀라게 했던 영화 중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만든 <2학년 3반>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다. 상영시간이 3시간 50분인 이 영화는 감독 본인의 1년을 기록했고, 내 마음을 움직였다. 영화를 보고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난 "이 영화에 굉장히 감동 받았고 당신은 좋은 감독이 될 것 같다. 좋은 감독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즉각적으로 그러더라. 좋은 일기를 쓴다고 해서 좋은 소설가가 된다고 믿느냐고 말이다. 어쨌든 그런 영화에 기회를 주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다. 2001년에 로테르담에 갔을 때 왕빙의 <철서구>를 본 적이 있다. 정부로부터 철거명령이 내려진 도시에 감독은 6밀리 카메라 하나만을 들고 가서 3년 반을 찍었다. 9시간 50분의 이 영화는 지구상의 한 도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꼼꼼히 담는다. 참고로 왕빙은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 영화를 만든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날로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능성의 장을 디지털이 열었다. 인상주의가 캔버스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디지털은 스튜디오가 아닌 거리에서 새로운 예술의 역사를 시작했고, 우리는 그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신디 2007’은 그러한 시대를 포착하고 담고 싶다. -현재는 경쟁부문을 아시아로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이나 남미 쪽의 프로그램들도 가져와야 할텐데. =이제 1회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우린 아시아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질문한 기자께서 편집장이 됐을때쯤 시네마 디지털 월드로 성장했으면 한다.(웃음) -서울에서만 상영되나. 전국, 더 나아가 아시아 각 도시에서 상영할 수도 있을텐데. =영화제의 이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은 여러분의 성원과 재능의 발견들로 인해 시네마 디지털 홍콩, 시네마 디지털 도쿄, 시네마 디지털 타이페이, 시네마 디지털 마닐라 하는 식으로 친구의 영화제로 성장한 순간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동시적인 영화제를 가능하게 한다. 20세기 영화제의 특징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로컬리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잖나. 칸에 가야 칸 영화제를 볼 수 있고, 베니스에 가야 베니스 영화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디지털 밴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영화제 차원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단, 무리하지 않고 더 많은 도시에서 형제의 영화제가 열리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