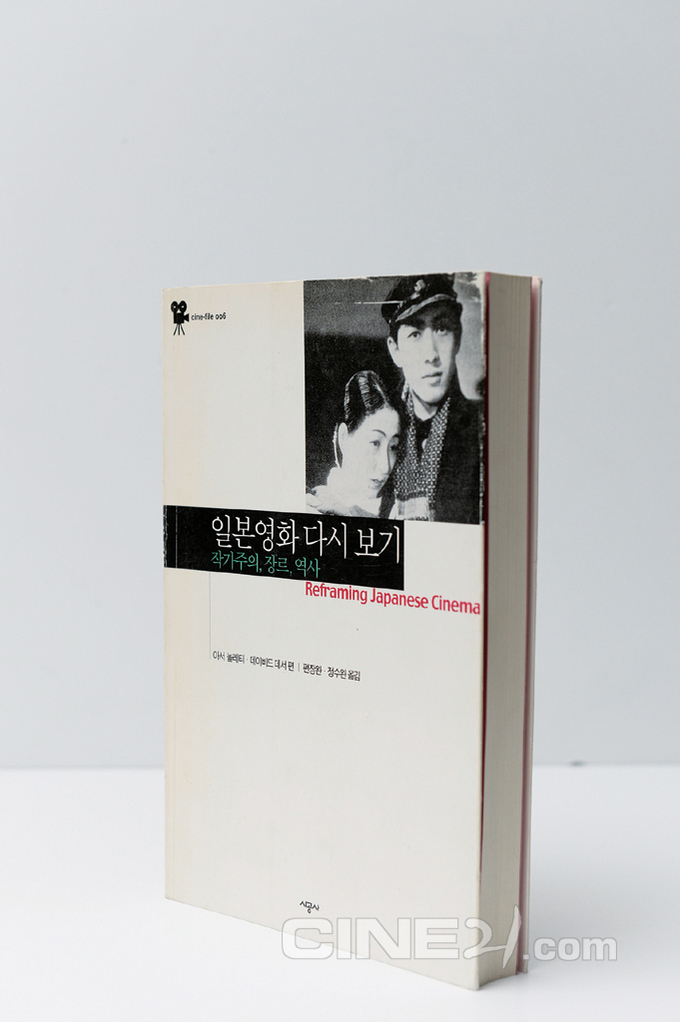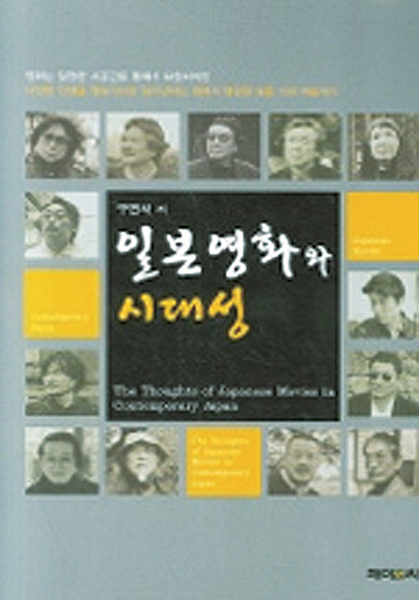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 일본영화의 활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소노 시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몇몇 감독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영감을 발견하긴 쉽지 않다. 최근 일본영화를 보면 기괴하거나 만화적으로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조용하고 심심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느 쪽이든 양식적인 극단만이 살아남고 중간이 없다. 한때 세계 영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던 영광의 시절과 비교하면 말라붙은 우물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랄까.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영화의 내공은 여전히 깊고 탄탄하다. 당장의 부침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듯한 망설임 없는 발걸음. <일본영화 다시 보기>는 일본영화의 이같은 저력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언뜻 말라버린 듯 보이는 영감의 우물 역시 한 꺼풀 밑을 들여다보면 도도하게 흐르는 젖줄 같은 역사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날 여전히 일본영화의 가치가 유효한 것은 전통의 힘에 기댄 바가 크다. 100년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일본영화 다시보기>는 5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일본영화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분석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이 책의 서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1950년대 이후 일본은 국제 영화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국내의 일본영화 서적 역시 대부분 이 시기를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국지적인 작품 분석과 작가론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50년대 일본영화 황금기의 동력을 그 뿌리에서부터 찾는다. 적지 않은 일본영화 전문서 사이에서 굳이 이 책을 다시 언급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자인 데이비드 데서와 아서 놀레티는 특정 관점과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편집하는 대신 미국, 프랑스, 일본의 평론가와 연구자들의 분석을 성실하게 엮어 모았다. 그 결과 거시적인 한편 미시적이고, 통시적인 한편 공시적인 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크게 작가, 장르, 역사로 구분된 이 책은 때론 감독별로 혹은 작품별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개념의 형성과 역사를 결부시켜 하나의 흐름을 짚어낸다. 뿐만 아니라 서구영화사의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부인과 외부인의 시선을 오가며 일본인, 일본영화, 일본 영화산업을 설명하려 애쓴다. 내셔널 시네마로서의 일본영화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소위 ‘일본적인 것’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의리와 인정’을 굳이 ‘기리’와 ‘닌죠’라고 표기하는 것은 그 언어적인 표현 위에 독자적인 감성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책에서는 사무라이영화나 야쿠자영화를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일본영화 고유의 장르로 언급한다. <일본영화 다시 보기>는 지역적 특수성과 미의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리된 글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일본영화에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들을 제시한다. 더불어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같은 분석의 토대가 되어준 방대한 자료의 축적이었다. 그 두터운 역사와 다양한 접근을 한국영화 연구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영화 다시 보기>는 일본영화에 대한 읽기 쉬운 개론서일 뿐만 아니라 영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도 모범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당신이 당장 위의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일본영화와 시대성> 구견서 지음 / 제이앤씨 펴냄 을 추천합니다
특정 영화와 주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간 <일본영화 다시 보기>와는 달리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된 책이다. 시대별로 일본영화의 경향과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통은 통독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일본영화 다시 보기>가 잡아낸 일본영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완독을 하고 나면 이후 어떤 미시적인 분석서를 읽더라도 영화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한결 이해가 쉬울 것이다. 어쩌면 오늘의 일본영화를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