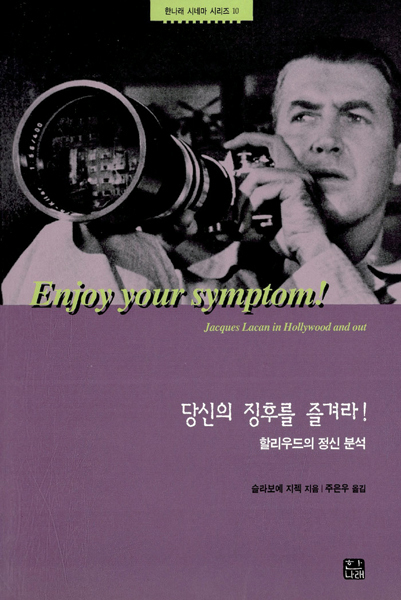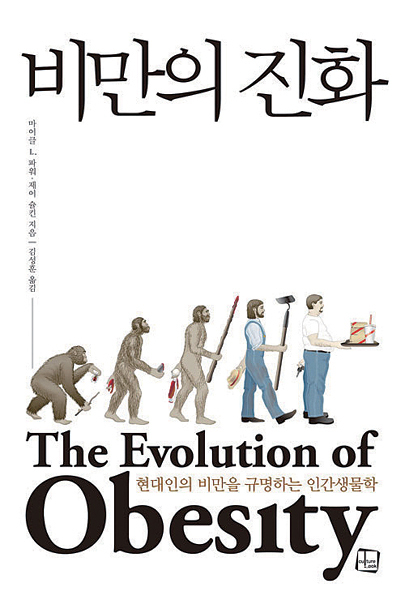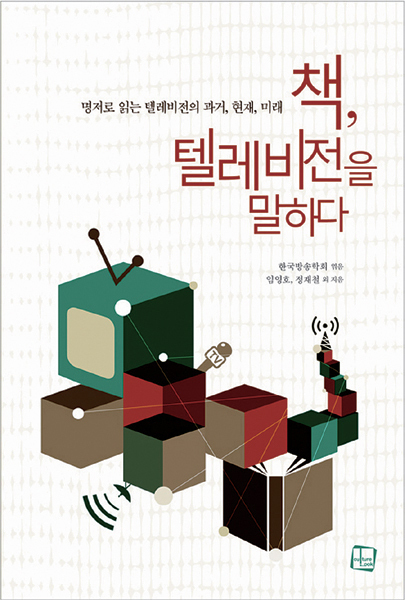영화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한나래’ 영화책은 있을 것이다. 다시 그를 뒤적여보면 모든 책에서 ‘책임편집 이리라’라는 이름도 함께 발견할 것이다. 과거 한나래에서 ‘한나래 시네마 시리즈’, ‘한나래 언론문화 총서’, ‘필름 메이킹 시리즈’ 기획을 주도했던 이리라 편집자가 새로이 컬처룩이라는 회사를 꾸렸다. 반갑게도 최근 토머스 샤츠의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개정판인 <할리우드 장르>를 냈다. 이른바 ‘씨네룩’ 시리즈의 첫째권이다.
-한나래의 모든 영화책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웃음) =그야말로 일만 했던, 그래도 참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웃음) 1990년대 초반 한나래 창립멤버로 일을 시작해 ‘한나래 시네마’, ‘필름 메이킹’ 시리즈 등을 기획했다. 50여종의 영화책을 기획, 편집했고, <필름 컬처>도 7호까지 냈다. 대중문화 연구 붐이 일던 때라 당시 한나래뿐만 아니라 시각과 언어, 이론과 실천, 현실문화연구 등에서도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 연구서들을 많이 냈다. 번역서의 비중이 컸는데, 당시에는 뭔가 안 팔리더라도 일단 내는 분위기였다. 좀 특별한 시절이었던 것 같다.
-최근 토머스 샤츠의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개정판 <할리우드 장르>를 냈다. 컬처룩은 어떻게 꾸리게 됐나. =2005년쯤부터 ‘필름포럼’과 ‘이모션픽처스’ 일을 하면서 출판업계를 떠났었다. 그러다 다시 2010년경 한나래로 돌아와 배리 랭포드의 <영화 장르>를 냈다. 원래 영화 장르에 관한 책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낸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의 경우 새 저작권법 발효 이후 판권료가 비싸져서 증쇄가 힘들어 절판된 거였다. 배리 랭포드의 책을 낸 것도 일종의 대안이었던 셈이다. 그러다 2011년 독립해서 컬처룩을 차렸고 다시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에 눈독을 들였다. 예전부터 독자들의 재출간 문의가 많은 책이기도 했다. 그래서 현재 회사 규모로는 힘들기도 했고 말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름 ‘씨네룩 총서’ 1권으로 정식계약을 맺고 출간했다. 개인적으로는 장점도 단점도 있는 책이라 생각하지만 장르 연구에 있어 그만한 책은 지금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과거 한나래에 있던 시절 ‘흥행’이 좋았던 책들은 뭔가. =아마도 그래엄 터너의 <대중 영화의 이해>가 가장 많이 팔렸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프랑시스 바느와의 <영화 분석 입문>, 슬라보예 지젝의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까지 해서 흥행 빅3 책들이었다. (웃음) 그외 수잔 헤이워드의 <영화사전>을 비롯해 <우디가 말하는 앨런>이나 <마틴 스콜세지의 비열한 거리>도 기억에 남는다. 기획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건 역시 감독에 관한 책들이었다.
-오래도록 영화책을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영화책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화려한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 화려한 면을 보고 뒤늦게 진입한 다른 출판사 분들도 봤지만, 이내 사라진 회사들이 많다. 2000년대 들어 인기 서적이라도 1천부 이상 팔리는 책은 정말 드물다. 가령 <보이는 것의 날인>의 경우, 프레드릭 제임슨의 글이 정말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남인영 선생이 훌륭하게 번역한 책을 야심적으로 냈다. 하지만 판매는 저조했고 현재 절판 상태다.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내다보면 독자층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한국의 극장가는 1천만 관객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 영화책 시장의 현실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다른 책은. =가장 가까이로는 영국영화연구소(BFI)에서 나온 존 힐의 <켄 로치>를 출간할 예정이고 비스콘티에 관한 책도 준비 중이다. 영화책 외에 ‘사이언스 캠프 시리즈’도 꾸준히 내고 있고 <책, 텔레비전을 말하다> 등 미디어 관련 서적도 이미 몇권 냈다. 최근에는 <비만의 진화>라는 책도 냈는데, 열심히 다른 책으로 돈 벌고 그 돈으로 평소 내고 싶었던 영화책을 내고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