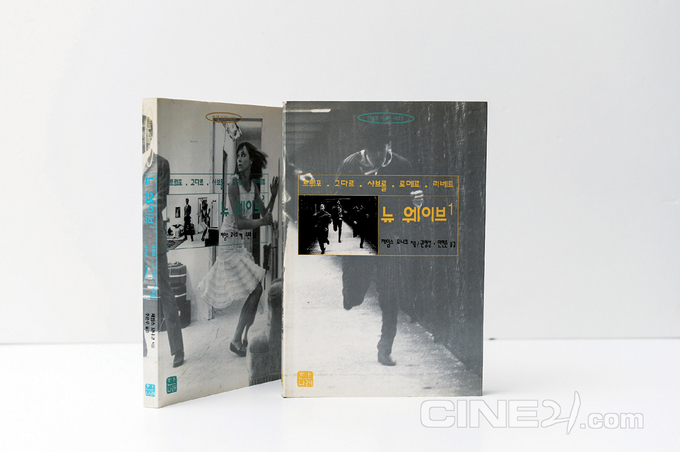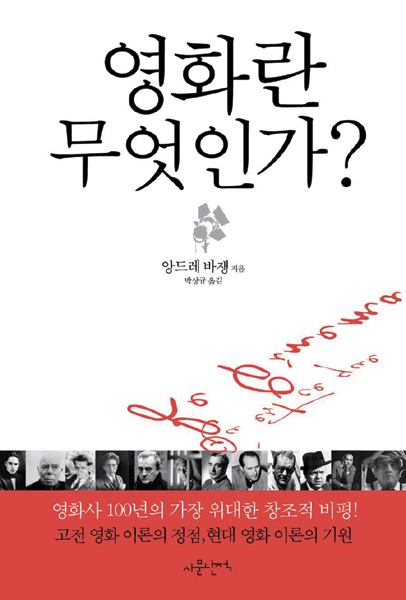젊은 프랑수아 트뤼포는 영화를 사랑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같은 영화를 두번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영화에 관한 평을 쓰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트뤼포를 비롯해 프랑스 영화비평지 <카이에 뒤 시네마>에 기고했던 다섯명의 영화비평가는 이후 차례로 영화감독이 되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화언어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장을 열었다.
1976년 발간된 제임스 모나코의 <뉴 웨이브>는 영화사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영화적 경향, 프랑스어로는 누벨바그, 영어로는 뉴웨이브라고 불리는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던 다섯명의 감독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뉴 웨이브>는 클로드 샤브롤, 프랑수아 트뤼포, 자크 리베트, 에릭 로메르, 장 뤽 고다르를 감독별로 분석한 다섯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모나코는 그들이 비평가 시절 공통적으로 주창했던 작가주의 정책, 그리고 장르영화에 대한 관심을 그들 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들의 영화적 스승인 앙드레 바쟁의 리얼리즘이 배태한 영화언어에 대한 윤리적 태도, 매체의 테크놀로지와 거기에서 연유하는 심리학이 그들 작품의 주요한 모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발간연도에 기인한 탓에 각각의 감독들의 데뷔 뒤 약 십여년간 발표했던 작품들만을 대단히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들의 이후 행보에 대입해보아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뉴웨이브를 태동시킨 다섯 감독들의 초기 십여년간의 작업이 그만큼 그들의 영화이력에서 핵심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나코는 <뉴 웨이브>에서 비평가 시절 다섯 감독들의 관심사, 즉 작가와 장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거꾸로 그들의 영화에 대입한다. 여기서 작가로서의 감독이란 단순히 한 작품의 전체를 통제하는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와 문화, 예술, 사상의 흐름이 만나는 일종의 교차로를 뜻한다. 모나코는 이러한 ‘작가’라는 이름의 교차로를 통해 영화가 소통의 도구, 즉 일종의 언어라는 사실을 작품으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감독들의 영화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는 더이상 홀로 떨어져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작가와 장르, 감독과 관객, 비평가와 영화, 이론과 실천의 총합이 된다. 따라서 영화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소재로 하고 있는 픽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안과 밖, 스크린의 앞과 뒤를 넘나드는 소통의 결과물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구조와 스타일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고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영화,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관객과 소통하는 영화를 지향하는 뉴웨이브 감독들의 태도는 곧 그들의 영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형식적 요소들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 고다르의 매체에 대한 정치적 사유, 에릭 로메르의 문학적 감수성, 샤브롤의 냉엄한 스릴러, 트뤼포의 서사, 리베트의 연극에 대한 관심은 소비하는 집단으로서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한 내밀한 대화로 관객을 안내한다. <뉴 웨이브>는 이러한 그들의 행보가 불러온 영화에 대한 거대한 인식 전환을 목도한 동시대 비평가의 생생하고 탁월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당장 위의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영화란 무엇인가?> 앙드레 바쟁 지음 / 박상규 옮김 / 사문난적 펴냄 를 추천합니다
프랑수아 트뤼포를 영화의 길로 안내해준 정신적 아버지였으며, 프랑스 뉴웨이브를 태동시킨 영화이론가 앙드레 바쟁이 발표한 글들을 모은 영화비평집인 <영화란 무엇인가?>에서 그가 주창했던 리얼리즘, 미장센과 딥포커스와 같은 개념들은 단순히 미학적 개념이 아닌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의 관계의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바쟁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능동적인 정신적 태도를 갖는 관객을 대상으로, 작가와 그를 둘러싼 세계의 변증법으로서의 영화언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