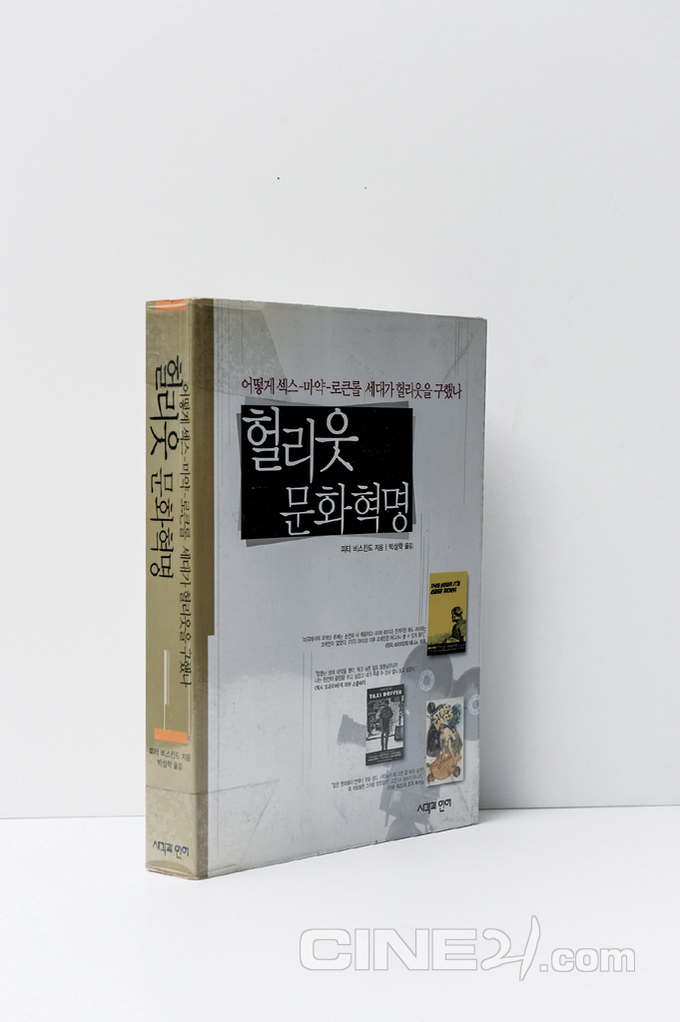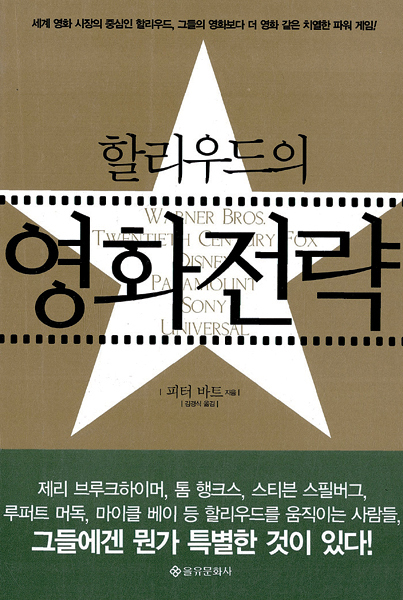빠른 속도감의 문체로 씌어진 <헐리웃 문화혁명: 어떻게 섹스-마약-로큰롤 세대가 헐리웃을 구했나>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뉴아메리칸 시네마를 유행시킨 당시 새로운 영화 세대가 어떻게 할리우드의 낡은 문법을 혁신시킨 뒤 좌절했는지에 관한 방대한 기록이다. 미국 영화 월간지 <프리미어> 기자 출신인 피터 비스킨드는 유머와 빈정거리는 어투와 진지한 비평적 논평을 결합해 예술적 야심이 탐욕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리낌 없이 기술하고 있다.
데니스 호퍼가 마약에 취해 만든 <이지 라이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할리우드는 젊은 히피 감성을 지닌 감독들이 새로운 돈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좋은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월요일 아침에 흥행 성적을 가지고 서로 굵기를 다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수뇌부는 “오로지 누가 삼삼한 영화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른 영화를 가지고 있는가”만을 문제 삼았다. 영화평론가 폴린 카엘이 마틴 스코시즈의 자전적인 갱영화 <비열한 거리>를 대단하다고 하면 그건 스튜디오 간부들에게도 대단한 것이었다.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은 완성 뒤 내부 시사 때 형편없다는 반응을 얻었으나 수정주의 누아르 걸작이라는 비평을 얻은 뒤 흥행에도 성공했다. 비스킨드의 표현은 이렇다. “형편없는 닭똥같이 보였던 것이 근사한 치킨 샐러드가 됐다.”
이 책에는 훔치고 싶은 재미있는 비스킨드의 표현들이 많다. 이를테면 스코시즈의 이 시기 영화에 대해 그는 “가공하지 않은 기록영화적 고증성과 환각적인 열병 상태 사이를 유연하게 헤엄쳐 갔다”라고 쓴다. 그의 표현들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정확하다. 뉴아메리칸 시네마를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보자. “로버트 알트먼, 할 애시비 등의 감독이 장르 해체 실험에 열중하는 동안 코폴라와 보그다노비치는 사망한 고전적 장르 공식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영화는 훗날 루카스와 스필버그가 앞장설 장르의 귀족화를 예견했다.” 여기 나오는 관계자들의 증언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한숨을 쉬게 만들기도 한다. 마틴 스코시즈의 말에 따르면 “1971년에서 76년까지는 최고의 시기였다. 우리가 막 시작한 때였기 때문이다. 모두 친구들의 다음 영화를 학수고대했다. 브라이언의 다음 영화, 코폴라의 다음 영화, 그들이 펼쳐낼 세계를 기대했다”. 할리우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 젊은 영화인들은 자긍심에 취하고 자신들의 뻗어가는 장래에 취하고 무한한 가능성에 취했다. 이들과 어울렸던 여배우 마곳 키더에 따르면 “우리는 늙지 않을 세대였다. 우리는 제도권으로 기어들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의견을 표명하는 영화를 만들 것이었다”.
물론 그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뉴할리우드 세대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마이클 치미노의 <천국의 문>은 이 모든 상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독자를 흥분시키는 문체로 당시의 젊은 영화감독들의 괴짜적 면모와 미치광이 같은 예술적 열정을 기록함으로써 이 책은 싸구려 선정주의 저널리즘과 비범한 예술적 비망록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말미에 이르러서는 한 시대의 위대한 기운이 다한 것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는 가운데 숭고한 감동마저 자아낸다.
당신이 당장 위의 책을 읽을 수 없다면, <할리우드의 영화전략> 피터 바트 지음 / 김경식 옮김 / 을유문화사 펴냄 을 추천합니다
<헐리웃 문화혁명: 어떻게 섹스-마약-로큰롤 세대가 헐리웃을 구했나>에 기술된 위대한 영화 악동들의 시대가 끝난 지 한참 뒤 현대의 할리우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밀한 속살을 들여다보는 책. 역시 저널리스트인 피터 바트의 경쾌한 문체로, 1998년 여름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마케팅 전쟁을 극적으로 서술한다. 1970년대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뤄진 할리우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실감시키는 저자의 필력이 인상적이다. 물론 이 시스템에 공감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사실 읽고 나면 좀 우울해진다. 판돈은 커지고 그만큼 더 질식할 것 같은 장사치들의 세계로 변해버린 할리우드 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