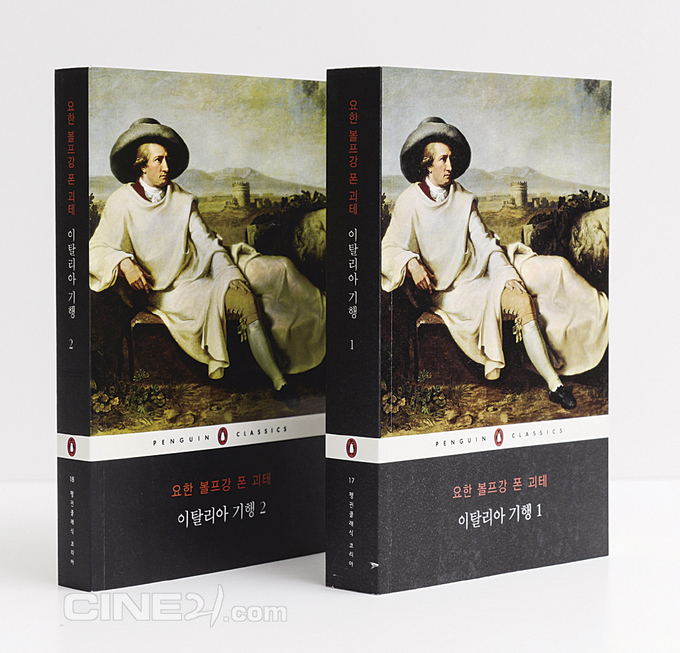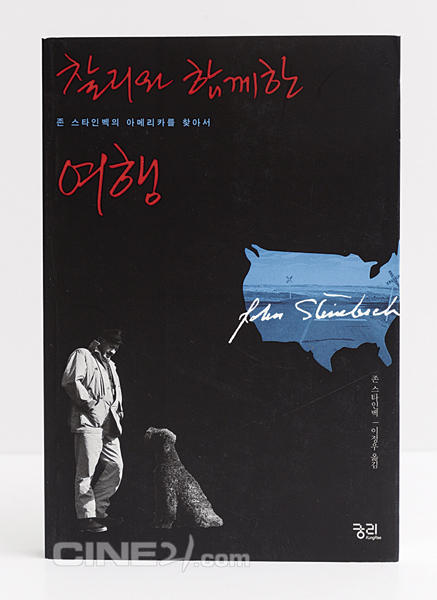괴테는 1786년 37살 때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떠났다기보다는 도피했다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당시 괴테는 삶의 첫 번째 절정에 도달해 있었다. 바이마르공국의 존경받는 공직자이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유명 작가,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교계의 유명 남성이었다. 24시간도 모자랄 일정이 그의 하루를 다 채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당분간 놓고 싶었다. 시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간 곳이 바로 이탈리아이다.
지금도 유럽인들은 알프스만 넘어가면, 곧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공기부터 다르다고 말한다. 자유롭다는 뜻이다. 과거에도 물론 그랬다. 괴테는 이탈리아의 북부 베로나에 도착한 뒤, 가르다 호수 주변 풍광의 장관에 넋을 잃었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앉아 있는 태평한 사람들의 태도에 매혹됐다. ‘모범생’ 괴테는 도착하는 도시마다 미술관과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걸작들의 품위를 <이탈리아 기행>에 기록했다. 그러나 진작 마음을 빼앗긴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나태에 가까운 삶의 느린 속도였다. 어느덧 그도 이탈리아인이 됐는지, 몇달 뒤 로마에 도착해서는 밤의 달빛을 즐기며 느린 산책자의 행복을 고백하기도 한다. “달빛을 한몸에 받으며 밤에 로마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태와 달빛으로 표현된 느림에의 매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고통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기행>(1954)에 나오는 영국인 남편(조지 샌더스)은 나폴리 사람들의 느린 습관에 넌덜머리를 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양 아래 길게 앉아, 낮잠을 즐기는 이들의 태평스런 태도에 도무지 섞이지 못한다. 반면 그의 아내(잉그리드 버그먼)는 나폴리에 점점 동화되어 간다. 아내도 괴테처럼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폴리는 낙원 같은 곳이다. 누구나 취한 것 같은 자기 망각 속에 살고 있다.” 괴테의 나폴리에 대한 인상인데, 망각할 수 있다면, 곧 반복을 잊을 수 있다면, 그곳은 낙원이 맞을 것이다. 나폴리는, 더 나아가, 이탈리아는 괴테에게 망각의 낙원인 셈이다. 우리에게 영화관이 간혹 그렇듯 말이다.
괴테에게 여행이 망각이라면, 고흐에겐 탈주다. 고흐는 여행을 통해 계속 현실의 반복을 깨고, 새로움에 끝없이 다가간다. 조국 네덜란드에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거쳐,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아를, 생-레미, 오베르에 이른다. 고흐의 치열한 삶은 곧 멈추지 않는 여행이다. 고흐의 편지를 묶은<Vincent van Gogh>에서 그는 동생 테오에게 자신의 방랑에의 운명을 이렇게 쓴다. “난 언제나 어떤 목적지를 향해 어딘가로 가고 있는 여행자처럼 느껴진다.”
여행- 괴테에겐 망각, 고흐에겐 탈주
여행자 고흐의 동반자는 별과 태양이다. 병이 악화되어 남프랑스의 아를 지방에 머물 때의 고독, 그리고 예술에의 열정은 모두 프로방스 지역의 별과 태양으로 표현돼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은 고흐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미친 듯 푸른 밤을 달리는 별들, 별빛이 반사된 밤의 강물, 몽롱하게 흔들리는 당구대 위의 불빛들, ‘밤의 카페’를 비추는 노란빛과 푸른 별들은 고흐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물 것만 같다.
37살 때 괴테가 새 삶을 모색했다면, 아쉽게도 고흐는 그 나이에 파리 북쪽의 오베르에서 70일간 머물다 권총자살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고흐는 건강을 되찾았고,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해 70여편의 작품을 남겼다. 곧 자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오베르의 편백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평생 흠모했던 밀레의 그림을 모사하며(고흐의 표현을 빌리면 ‘번역’하며) 창작에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러고는 동생에게 쓴 편지 하나를 호주머니에 남긴 채 죽고 말았다. 유서 같은 내용이 아니었고, 동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한 편지였다. 그런데 이때 유작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1890)을 남겼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가들은 그의 마지막 여정은 그림의 밀밭 너머에 있는, ‘저곳’에 대한 염원일 것 같다고 말한다. 치열함은 그만 내려놓고, ‘영원한 휴식’의 시간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간혹 경험하듯 말이다.
스타인벡, 회귀의 여행
<에덴의 동쪽>의 반항아 같은 존 스타인벡은 58살 때인 1960년 느닷없이 미국 일주에 오른다. 하긴 평소에 헤밍웨이를 닮고 싶어 했으니,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때 스타인벡은 막 큰 병을 앓고 난 뒤였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스타인벡은 조그만 픽업트럭에 캠핑카를 얹고, 애견 찰리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내 나라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동기를 밝힌다. <찰리와 함께한 여행>은 그 기록이다.
여행은 스타인벡다운 기질로 넘친다. 그는 지도를 펼치지 않고, 아니 지도를 던져버리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차를 몬다. 유명 관광지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는 맨몸으로 미국을, 미국인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적당한 곳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그곳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몸으로 미국을 마주한다. 당시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스타인벡은 미국 동부 백인들의 완강한 보수주의부터 남쪽 텍사스의 인종주의자들, 그리고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동포들을 만난다.
스타인벡은 가을부터 4개월간 뉴욕에서 출발하여 국경선을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데, 그럼으로써 모국(Motherland)의 풍경을 가슴에 담는다. 모든 여행은 어머니의 품을 찾아가는 순례이고, 여행에서 만난 풍경은 결국 어머니의 은유라는 서양의 옛말은 스타인벡의 여행기에서 확인된다. 그러고 보니 괴테의 이탈리아의 폐허, 고흐의 밀밭도 어머니의 은유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영화관에서 종종 경험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