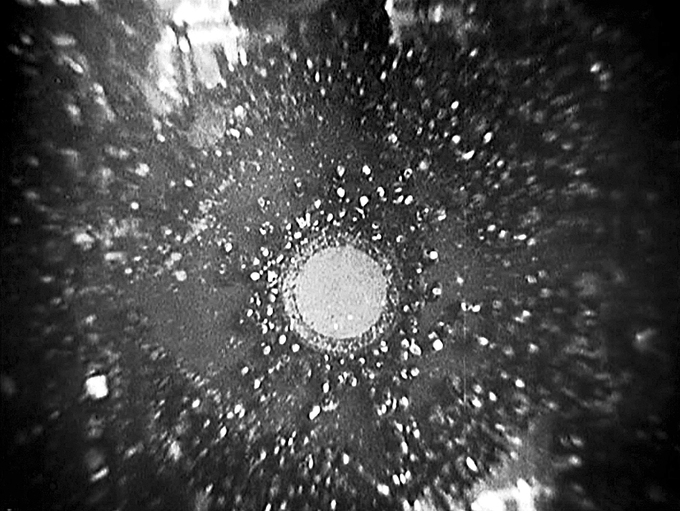역사학자답게 리처드 아벨은 <돈>에 관한 긴 글을 “무성영화의 마지막 시기에 유럽의 양끝에서 돈과 자본이라는 주제로 두편의 영화가 기획됐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영화로 옮기는 거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1927과 1928년에 걸쳐 진행되던 영화는 제작 초기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는 마르셀 레르비에가 에밀 졸라의 <돈>을 각색한 영화를 준비했다. 80여년 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두 사회는 왜 동시에 돈과 자본을 영화의 주제로 삼은 것일까. 에이젠슈테인의 입장이야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레르비에가 자본주의 사회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의 막다른 골목을 이미 보았거나 예견했을 터, 그들은 깊이 근심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려 했던 것 같다.
초기부터 독특한 형식의 실험적인 작품을 내놓은 레르비에는 졸라의 고전을 각색하면서도 현대적인 색채를 가미했다. 배경을 1860년대에서 1920년대로 바꾸었고, <비인간> 등에서 선보인 초현실적인 구조물과 건축물을 활용해 20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소돔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아멜랭 부부는 가난하다.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내를 보며 남편은 씁쓸하게 “돈을 사랑하는군”이라고 말할 뿐이다. 아내의 열망에 못 이긴 아멜랭은 금융계를 주무르는 사카르와 손을 잡는다. 탐욕에 눈이 먼 사카르는 투기를 조장하며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다 금융계의 큰손 귄더망과 남작 부인의 작전에 말려 나락으로 떨어진다. 비록 자본의 신성함에 의문까지는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르비에가 바라보는 현실과 미래는 밝은 모습이 아니다. 돈의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자본가와 그의 주변을 곤충처럼 떠도는 인간들의 얼굴에서 레르비에는 추악한 영혼을 본다. 가진 자들의 파티와 화려한 공간 너머로 공허함과 천박함을 발견한다. 건전한 금융행위에 일말의 희망을 품는 듯하나, <돈>의 에필로그는 돈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을 비꼬는 걸 잊지 않는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선한 자본주의, 건전한 금융에 대해 의문이 든다. 요즘 CF의 태반은 이동통신, 금융과 관련돼 있다. 이동통신의 득세가 텅 빈 정신세계를 반영한다면, 금융상품 광고는 불안과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한쪽에서 상해와 질병을 걱정하는 척하며 보험에 들라고 권하고, 다른 한쪽에선 노후가 불안하지 않느냐며 연금을 들이민다. 돈을 빌려 더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대부업체의 한심함은 입에 담기조차 싫다. 돈은 절대 정신을 치유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금융산업이 진정 원하는 건 ‘이익의 독식’이며, 그들로부터 얻는 건 자본주의의 더러운 쾌락에 불과하다. 스탕달은 <파르마의 수도원>을 ‘소수의 행복한 자들’에게 바쳤고, 크리스 마르케는 <아름다운 5월>을 ‘다수의 행복한 자들’에게 바쳤다. <아름다운 5월>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피곤한 삶을 보내기에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는 중년 남자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스탕달과 마르케가 뜻하는 바는 같다. 행복한 자는 세상의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당신의 불행이 돈때문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나. 돈을 불태우라. 그때 나는 당신과 손을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