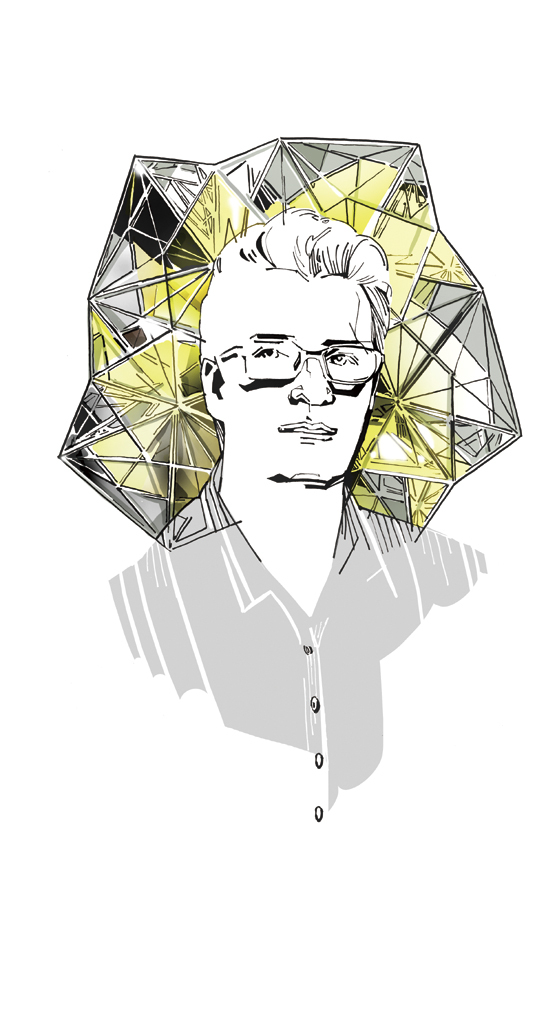청담동의 어느 갤러리에서 올라퍼 엘리아슨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듣자 하니 벌써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다녀간단다. 거울, 만화경, 스펙트럼, 투명한 판들, 그리고 프로젝션 몇개. 그의 프로젝트가 가진 거대한 스케일을 생각하건대 조그만 갤러리에 걸린 소품 몇개로 그의 작품세계를 가늠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작품세계의 본질을 슬쩍 엿보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빛’과 ‘공간’의 현상학적 체험.
공간실험
올라퍼 엘리아슨 1967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아이슬란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덴마크 왕립예술원에 재학하던 중에 학교의 여행지원으로 뉴욕으로 건너가 그곳의 한 스튜디오에서 조수로 일했다. 1993년 독일의 쾰른으로 건너가 1년간 머문 뒤 다시 베를린으로 옮겨 그곳에 차린 스튜디오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베를린 미술대학(UdK)의 교수로, 대학 산하에 ‘공간실험연구소’(IfREX)를 창설하여 활발한 실험과 창작을 하고 있다.
1996년 엘리아슨은 건축가이자 기하학 전문가인 에이너 토스테인과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토스테인은 지오데식(geodesic) 건축으로 유명한 버크민스터 풀러의 친구였다고 한다. 공동작업의 산물인 <8900054>(1996)는 스테인리스 골재로 짠 반(半)구형의 구조물로, 마치 땅에 묻힌 거대한 공이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업 이후 풀러와 토스테인에서 유래한 이 건축적, 공학적 구조물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작품의 일부가 된다.
그 뒤로도 엘리아슨은 수많은 건축가 및 건축이론가와 공동작업을 했다.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IfREX)를 그는 ‘실험실’(Lab)이라 부르는데, 이 실험실에는 현재 약 30명의 건축가, 공학자, 장인, 조수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과 함께 엘리아슨은 조각, 설치는 물론이고 건축 스케일을 가진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험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그의 작업이 예술과 과학 혹은 공학과 통합된 기술미학의 차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를 세계적으로 알린 것은 아마도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 설치한 <날씨 프로젝트>(2003)일 것이다. 갤러리의 홀에 엘리아슨은 수백개의 램프로 이루어진 거대한 디스크를 걸어놓았다.
이 디스크는 마치 바깥의 해를 실내로 옮겨놓은 듯한 효과를 낸다. 홀의 내부는 가습기로 만들어낸 옅은 안개로 가득 차고, 관객은 천장 전체를 덮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이 인공적으로 연출한 전형적인 런던의 날씨 속을 거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영국의 안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으나, 터너가 그것을 그리자 비로소 사람들이 안개를 보게 됐다는 말이 있다. 터너가 화폭 위에서 빛과 안개의 어우러짐을 시각적으로 재현했다면, 엘리아슨은 공간 속에서 그 효과를 촉각적으로 연출한다. 안개 속으로 번질 때 빛은 만질 수 있게(“tangible”) 된다. 그의 작품들- 가령 <당신의 눈먼 행인>(2010)이나 <느낌은 사실이다>(2010)- 에 인공 안개가 종종 사용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만화경이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의 램프이나 거울이나 투명한 판의 반사효과로 공간에는 수많은 불빛이 생긴다. 물론 이 불빛들은 반사, 반사의 반사, 혹은 반사의 반사의 반사로 생긴 가상적(virtual)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 역시 한갓 착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경우 공간 자체가 이미지가 투영될 만한 매질로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한마디로 공기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셈이다.
로카나, 빛의 방
내게 엘리아슨의 존재를 알려준 것은 작곡을 하는 누이였다. 그의 작품의 영감을 받아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카나>(2008)를 작곡했다. ‘로카나’(Rocana)는 산스크리트어로 ‘빛의 방’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보아 그의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빛의 연출을 보았던 모양이다. 엘리아슨이 사용하는 재료는 물감이 아니라 빛 그 자체다. 간혹 물감을 사용할 때조차 그는 그것을 일종의 빛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붓칠은 결국 스펙트럼에 가까워진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아슨의 작업은 중세예술을 닮았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중세미학의 요체는 ‘빛의 상징주의’에 있었다. 비잔틴과 로마네스크의 모자이크가 주는 색채의 충격,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몽환적 빛의 효과를 생각해보라. 중세의 장인들은 촛불, 자연광, 색유리, 금과 은, 보석 등 ‘재료’를 사용해 빛과 색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재료가 뿜어내는 감각적 광휘를, 그들은 초감각적인 천상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이해했다.
중세예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작용은 반짝이는 재료의 처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중세예술은 르네상스 예술과 구별된다. 가령 르네상스의 화가 알베르티는 반짝이는 재료의 사용을 금하고, 모든 것을 물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작열하는 빛이라도 흑과 백의 적절한 대조를 이용하면 못 그릴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 인공의 빛을 재료로 작업하는 엘리아슨은 오랫동안 잊힌 중세예술의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 셈이다.
성당은 실용적 건물이기 이전에 ‘체험’의 공간이었다. 모자이크에서 뿜어내는 색채의 물결,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물결 속에서 중세인들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의 모습을 미리 느껴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중세의 건축 공간은 일종의 신학적 가상현실이었다. 엘리아슨의 설치 역시 ‘체험’의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에게 없는 것은 체험의 신학적 차원이다. 중세의 건축공간과 달리 엘리아슨의 것은 세속적 가상현실이라 할 수 있다.
촉각적 공간과 가촉적 빛
그가 말하는 ‘체험’은 어떤 것일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관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물의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저 관찰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미 사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셈이다. 우리의 신체는 그저 공간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세계의 상태는 변화한다.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세계의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 이것이 그가 작품을 통해 주제화하는 ‘체험’이란 것이다.
한마디로 건축적 스케일에 육박하는 구조공학으로 ‘공간’을 창조하고, 그 공간을 ‘빛’의 매질로 채움으로써 관객을 새로운 지각적 체험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엘리아슨이 하는 작업의 요체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체험이 있다.” 그의 공간은 신체를 움직여 체험하는 촉각적(tactile) 영역이며, 그가 연출하는 빛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법한 가촉적(tangible) 환영이다. 그가 하는 작업은 현상학적 지각의 실험이다.
주체와 객체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현상, 즉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색채, 음향, 촉감, 냄새 등을 현상학적 ‘질’(qualia)이라 부른다. 관객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지각을 주제화한 것은 엘리아슨이 처음이 아니다. 60년대에 몇몇 미니멀리스트들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영감을 받아-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지각을 주제화한 바 있다. 엘리아슨 역시 이 현상학적 실험의 연장선 위에 있는지도 모른다.
엘리아슨에게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가 만들어내는 이 현상학적 ‘질’의 색다름에 있을 것이다. 빛과 공간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나, 엘리아슨의 속에서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마치 물질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의 공간은 촉지적이며, 그의 빛은 가촉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