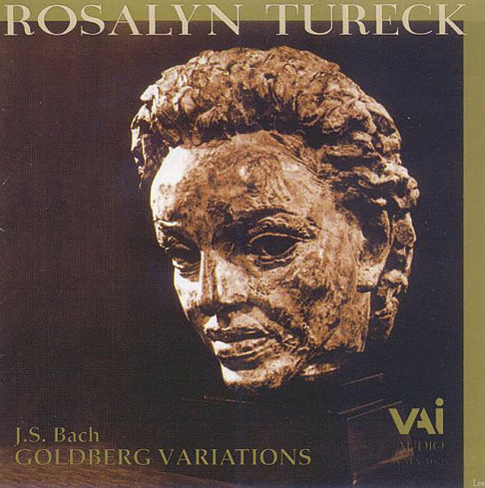‘타인의 취향’이라고 이름 붙은 이 코너에 뭘 쓸까 며칠간 망설이다가 취향이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해 제대로 질문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향은 무엇인가, 나의 취향은 무엇인가, 내가 타인의 것이라고 느끼는 취향은 무엇인가 하는. 예컨대 이런 것이다. 나의 패션 취향은 알렉사 청이다. 맞다, 그 패셔니스타 말이다. 웃기게도, 알렉사 청이 입는 사이즈의 옷도, 그런 스타일의 옷도, 그 가격대의 옷도 내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번 산 운동화는 떨어질 때까지 신고, 일주일에 3번은 배낭을 메고 출근하고, 마음에 든 스트라이프 티를 색깔별로 5벌 사서 돌려입는 나라고 해서 취향도 구릴쏘냐. 내가 나의 취향에서 소외당하는 셈이지만… 내가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없는 현실에 적응했다고 해서, 내 현실이 취향까지 규정짓게 할 수 있나?
하지만 패션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책과 음악에 대해서라면 나의 취향은 나의 소비와 일치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내 취향은 나의 것인가? 나의 문화적 취향이 내가 속한 계급을 말해주기 때문에, 나의 취향을 ‘이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지는 않나? 솔직하게 취향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 취향이 어떻게 보일까 자기 검열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뜻이다. 초등학생 때 내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었는데(물론 자유시간의 90%는 미제 팝음악을 섭렵하며 보냈다), <비창>을 듣다가는 심지어 울기도 했다. 그 말을 들은 지인이 “역시 초딩이었구먼” 하고 키득거리는 통에, 한동안 차이코프스키 알레르기로 고생하기도 했다. 90년대에는 밀란 쿤데라의 책 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좋아하느냐 <농담>을 좋아하느냐로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 견지하는 태도를 가늠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작가의 대표작 두편 중 어느 쪽을 ‘좋아하느냐’의 문제는 정치적 의식의 성숙도(혹은 세상물정 모르는 낭만주의적 경향의 바로미터)로도 평가되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좋은 ‘공식적’ 취향을 라이너스의 담요처럼 두르고 다니기도 한다. 지랄맞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섬세하고, 약간은 거친 듯하지만 알고 보면 차분하며, 적당히 박학다식하면서 좋아하는 분야는 깊게 파고드는 듯 보이는, 결국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취향의 매뉴얼. 대신 가장 손타는 것들, 혼자 즐길 것들은 침대 밑이나 ‘직박구리’ 폴더 안에 넣어두고 친한 사람들과만 공유한다는 식이다. 어떤 것은 너무 천박해서, 어떤 것은 너무 우아해서, 어떤 것은 다 같이 즐기기 아까워서! 이런 쓸데없는 비밀주의에 맛들였으니 취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글을 쓸 수 있겠나. 그런 연유로 이번 ‘타인의 취향’은 이것으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