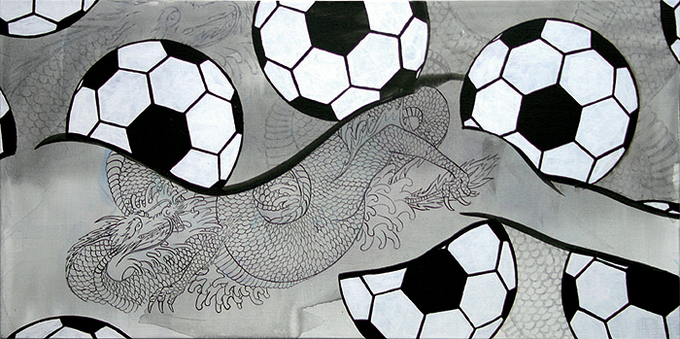천경자의 풍경에는 늘 여인과 뱀이 있었다. 이숙자의 캔버스에는 보리 물결이 넘실거린다. 얼마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김점선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말과 오리, 그리고 꽃이 떠오른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화가가 좋아하는 주제를 자주 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관객이 화가가 사랑하는 주제를 곧 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억지가 아니다. 시사점은 다른 데 있다. 천경자의 여인, 이숙자의 보리밭, 김점선의 꽃은 모두 ‘여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읽혔다는 것. 여류화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화단에서, 여성작가들은 젠더의 문제를 지나칠 수 없었다. 개인의 개성 이전에 여성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선구자로서 중견 한국 여성작가들의 업보였다.
장유빈, 조영아, 박은선, 양연화. 네명의 신진 여성작가들이 함께하는 기획전이 4월17일까지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 ‘사적계보’란 제목이 붙여진 건 꽤 신선하다. 이제 막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이들은 후배들을 밀어주고 당겨줘야 하는 책임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거기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비주류였던 여성작가들에게 관대함을 내보이는 미술계의 변화도 한몫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진 여성작가들은 드디어 온전히 사적인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좀비(장유빈), 상실(조영아), 희생(박은선), 인공(양연화)을 얘기하는 네명의 작가들에게서 ‘여자로서’, ‘여자이기 때문에’ 등의 의식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페미니즘적 고민을 스스로 거세함으로써 남성작가와 대등하게 겨룰 토대를 마련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노암씨의 말대로 “비로소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세대의 여성 미술가들이 등장한 것일까. 이들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