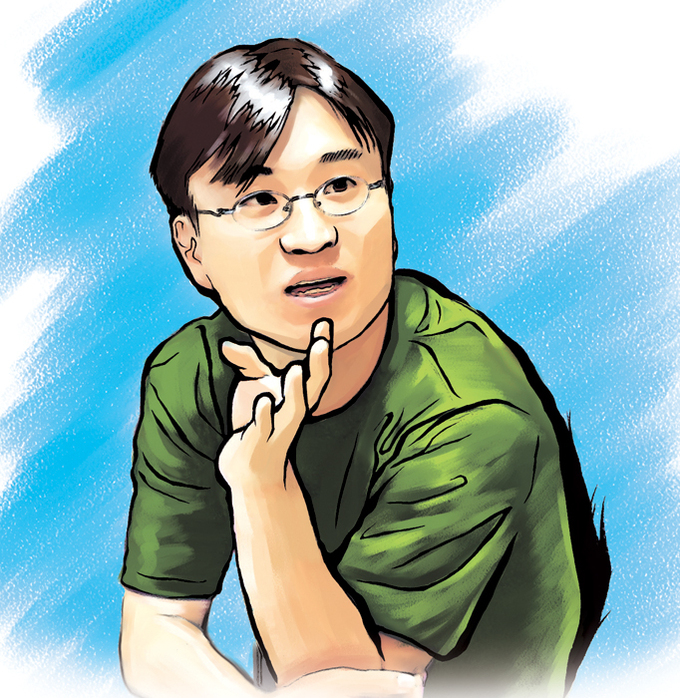내 친구는 언제부턴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생명이 위독한 병은 아니고, 이른바 난독증(難讀症)이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그에게 난독증은 ‘종양’ 이상일 것이다. 생활고에, 병마와도 싸워야 하는 친구의 하소연은 지난해 말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됐는데, 그 단계별 증상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책을 읽는 동안 시시때때로 남은 쪽수의 두께를 끊임없이 체크한다”. 좀더 병세가 진전되면 책의 무게를 달아보는 돌출 행동도 서슴없이 자행한다. 책의 사진, 도표, 행간의 간격을 꼼꼼이 살피는 것도 난독 세균이 꽤 침투했다는 증거다. “출판공들이 해야 할 작업을 독자가 대신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병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뜻한다. “기계적으로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종이를 넘겨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의심없이 수행하면 중기란다.
적절한 치료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에 말기로 즉각 이행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매직아이 효과’인데, “글을 읽고 있는지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지 혼동”한다. 시각적 기관인 눈과 대상으로서의 텍스트 사이에 “제3의 공간이 창출되는” 기이한 상황을 경험하는 순간이다(<씨네21> 동료 중 누군가도 비슷한 토로를 한 적 있다. 그는 책을 읽다보면 글자들이 눈앞으로 급작스럽게 튀어오른다고도 했다). 이러한 비현실적 상황 아래서 “신체의 에너지 소모는 극대화” 할 수밖에 없는데 “정력의 눈금이 바닥을 치면” 수면에 빠져들거나 타액을 방출한다. 위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몸뚱이의 선택이다. 친구의 자가임상 결과에 따르면, 추한 꼴을 노출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체 이탈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신도 모르게 “뻘짓을 하게 되는” 경지까지 도달한다.
친구의 고백을 전해듣고서야 난독증이 남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 또한 ‘후천성 난독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직장 생활을 한 뒤로 끝까지 ‘정독해서 읽어내린’ 책이 몇권 없다. 매주 계속되는 마감으로 인한 심신 피곤과 이로 인한 집중력 감퇴가 독서 의욕을 감퇴시켰을 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500, 600쪽짜리 책은 문제없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사실 새해 들어 작심한 게 있다. 1년에 책 50권만 읽자고, 그래서 거창하게 필독서 목록까지 뽑았다. 하지만 주중 휴일을 이용한 독서 삼매경 시도는 결국 난독증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에 불과했다. 현란한 수식의 이론서가 아닌 간단한 문장들로 이뤄진 평전을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쪽 이상을 한번에 읽어내리지 못하곤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내 신체는 ‘독서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전문가도 모르는데 내가 후천성 난독증의 원인을 알겠는가. 다만 심각한 건 이 증세가 모든 텍스트에 대한 거부로까지 확대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뭣보다 내 밥벌이의 원천인 영화 감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불과 1시간 전에 본 영화인데도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까마득할 때가 많다. 누가 물어보면 뒤죽박죽 헷갈린다. 간단한 프리뷰를 써야 할 때도 머릿속이 진공상태인지라 매번 시사회가 끝나면 영화사에 심의용 대본을 요구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꿰맞춘다. 지독한 텍스트 거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양을 갈 수도 없는 일이다. 어쨌든 수수방관할 수 없어 며칠 전에 올해 들춰보거나 틀어보지 않을 것 같은 수백권의 책과 DVD를 처분할 요량으로 짐을 쌌는데, 올해 연말이면 이 자가처방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