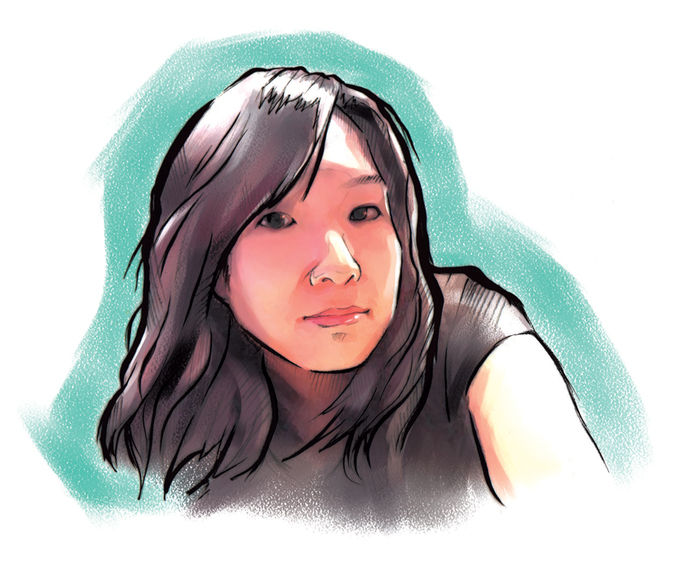“끼야-. 저 남자는 어쩜 저렇게 아티스틱하면서도 지적일까. 분명 어지간해선 화도 안 내고 자상한데다가 환경주의자에다 페미니스트일 거야!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너무 멋져x100!!”
얼마 전 <팝툰>의 만화 <플리즈, 플리즈 미>를 보다가 푸핫 웃어버렸는데 이런 장면이었다. 주인공 구애리가 클럽에서 미남 DJ를 바라보며 맘속으로 째져라 비명을 지른다. 구애리가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석사논문 준비하느라 앨범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요”라는 멘트 한마디와 그의 스위트한 외모뿐이지만 구애리의 상상적 기대는 그 몇 조각 단서를 이어붙여 이 남자를 고학력 중도진보 성향 여성의 판타지로 만든다. 만약 구애리가 이 DJ와 계속 이어졌다면 그녀는 상상 속의 그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실은 ‘자체 필터링’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 현상의 일종인데, 사소한 대목이었지만 공감이 번뜩이는 이야기였다(아무튼 구애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미남 DJ와는 아무런 인연없이 문란한 ‘벨트 소동’에 휘말려 망신살만 뻗친다).
마악 설렘을 느끼기 시작한 상대의 손에 어쩌다 카프카의 책이라도 한권 들려 있으면 그의 문학적 깊이를 상상하며 더 멋있게 느끼는 것처럼 책이나 영화 취향, 식성, 옷을 고르는 성향, 사소한 말버릇 등 몇몇 단서의 성긴 틈을 메워 근사한 이미지로 완성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해력과 상대에 대한 애정에 달렸다.
지난달 김혜리 선배의 지난 기사들을 모은 신간 <영화야 미안해>를 서점에서 샀다. 이 아름다운 책에 선배의 자필 사인을 받아 소장하고픈 ‘팬심’ 때문이었다. 선배는 부탁한 사인뿐 아니라 나에 대한 ‘인평’을 책에 남겨주셨는데, 그건 선배가 흘긋 관찰한 나에 대한 단서의 틈새를 못난 후배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기대로 채운 너그러운 글이었다. 나는 그 글 앞에 얼굴을 화끈 붉히고 ‘선배, 저 열심히 해서 꼭 이런 사람이 될게요’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야만 했다.
선배가 연재했던 ‘김혜리가 만난 사람’의 인터뷰이들이 아름다워 보였던 이유도, 물론 그들의 성취와 가치관이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고 풍부한 주석을 달 줄 아는 선배의 깊이와 인품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매력없는 영화에 대해 쓰는데 어떻게 매력있는 기사가 되겠어?’라고 투덜거린 것은 나의 치졸함이고 부족함의 소치다. 반대로 비판할 지점에 날카롭게 비판하지 못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처음 <씨네21>에 들어왔을 때 한 선배가 수습 시절 남동철 선배에게 들은 말이라며 이런 말을 해줬다. “아무리 영화가 별로라고 해도 너의 영화 기사가 별로여선 안 돼.” 이런 말을 새삼 새기는 이유는 영화기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모양새인지 풀어내는 능력도 결국 내 인격과 안목에 달렸다. 어떤 글과 생각을 생산하든 간에 이 점을 잊지 않는 게 직업상의 윤리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못난 후배를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어디서도 얻지 못할 가르침을 주신 선배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