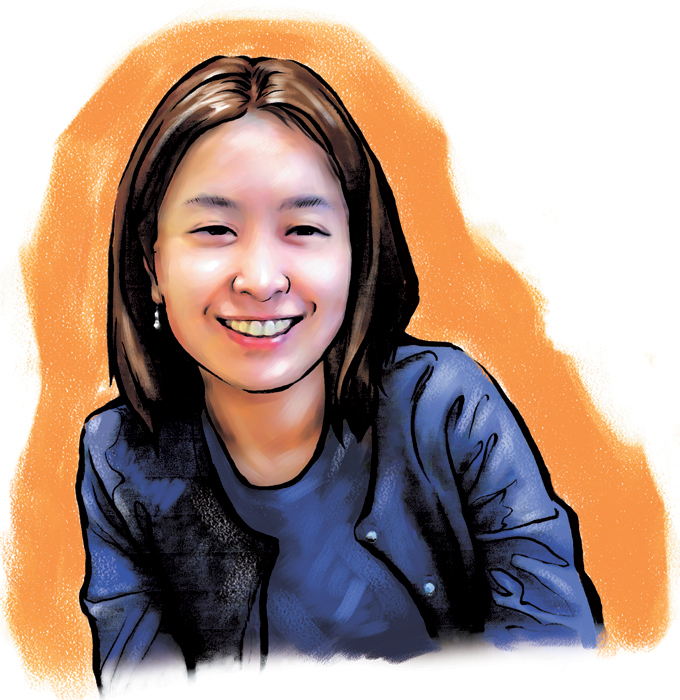만 다섯살이 좀 넘은 우리집 개 ‘남이’는 언제나 아픈 상태다. 2004년 여름엔가, 그러니까 2년 반쯤 전에 ‘페디그리’라고 하는 유명한 제조사에서 나온 사료를 먹고나서 그렇게 됐다. 당시 같은 종류의 사료를 먹고 죽은 개가 엄청 많았다. 타이에 있는 페디그리 생산공장에서 공정의 위생상 실수로 곰팡이가 섞인 사료를 제조해 내보냈고 그걸 먹은 개들이 집단으로 신장 결석이 생긴 것이었다. 남이도 그때 죽을 운명이었다. 처음에 이유없이 사료를 거부하기에 우리집 식구들은 얘가 밥 투정을 한다고 생각했다. 가벼운 구토와 설사 증세가 심해지더니 어느 날 쓰러졌다. 동네에서 제법 큰 병원을 찾아가니 의사선생님 왈, “이렇게 해서 온 개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했다.
남이는 그 와중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집에 돌아왔다(한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8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물론 페디그리사에서 보상해줬다. 덕분에 당시 동물병원마다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적어도 남이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은 그랬다). 의사선생님은 우리집 개를 사례로 삼아 논문까지 쓰고, 남이는 ‘진료비 걱정없는 헌신적 치료’로 거짓말처럼 건강해져 돌아온 것이었다. 완쾌는 아니었다.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신장이 원래의 30%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개의 몸 크기를 생각하면 이는 큰 무리라 남은 30%의 신장도 계속 나빠질 거라고 했다. 말하자면 언젠가 신장이 다 망가져 제 명에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남이는 건강에 별 문제없는 것처럼 잘 살아왔다. 타고난 성격도 둔하고 쾌활해서 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다. 1년 정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몇주에 한번씩 반복하던 남이는 최근에 다시 사료를 거부하고 살이 죄다 내려 뼈만 남은 채로 병원에 실려갔다. 요즘 남이의 몸 형태는 아주 기이하다. 가슴까지는 크기가 정상인데, 신장이 있는 허리 아래부터 뒷다리까지 뼈가 쪼그라든 것처럼 가슴 너비의 절반이 됐다. 남이는 전혀 뛰지 못하고, 목욕 뒤에 제 몸을 털지 못한다. 하체에 힘이 남지 않은 남이는 걷다가 종종 넘어진다. 남이는 털이 풍성한 페키니즈종인데, 목욕할 때 물을 맞고 털이 잦아들면 멀리에서도 몸통의 갈비뼈 개수를 셀 수 있다.
고2 때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원자력병원에서 오른쪽 가슴 절개수술을 받으셨을 때, 지난 여름 고희를 넘기신 외할머니가 모 병원의 성의없는 관절수술로 링거 호스가 무릎 속에 잘못 꽂혀 밤새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야 했을 때, 나는 내가 절대 잃지 않을 거라 믿었던 존재들과의 이별을 추측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동물의 목숨을 사람 목숨에 비교할 순 없을 것이다. 햇볕 잘 드는 거실 한구석의 푹신한 곳에 앉아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새까만 눈동자에 코 납작한 남이가 어느 날 사라지면, 그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