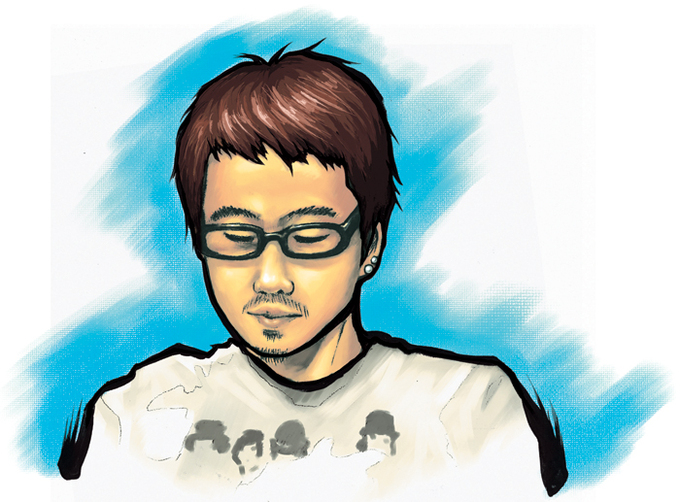이쓰코 히라이의 메일이 왔다. “구스 반 산트 작업실로 가서 두어 시간 인터뷰를 했고, 그 사람 개랑도 놀았어. 작업실이 아주 멋져. 꼭 그런 방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꽤 이름난 일본의 문화잡지에서 일하다가 최근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긴 그녀는 일본 잡지에 기사를 팔며 밥벌이를 하는 프리랜서 기자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반문했더랬다. 다른 잡지 기자들도 물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반문했더랬다”고 답했다.
칸영화제에서 다른 일본 여기자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놀랐다.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명이 “일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탱탱한 피부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스물예닐곱으로 생각했던 그녀의 나이가 마흔 중반이라는 걸 알고는 “과연 불가사의!”라고 소리를 꽥 지르긴 했지만, 그저 파리에 살고 싶어서 파리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그녀의 말이 더 놀라웠다.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면서 유럽의 영화계 소식들을 일본 잡지에 파는 것으로 파리의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있다니, 복도 많은 것들. 부러워서 명치가 쑤셨다.
명치가 쑤신들 어쩌랴. 잡지왕국에서 살아가는 기자들의 처지를 뱁새가 황새 쫓듯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지. 최근 몇달간 중고서점에서 일본 잡지를 훔쳐보거나 구입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러다보니 ‘어쩜 그렇게 자기들 만들고 싶은 대로 잡지를 만들까’ 부러워 명치가 쑤시는 일도 덩달아 잦아졌다. 한호의 2/3를 ‘B급영화 특집’으로 채우는 영화 월간지, 한호의 거의 대부분을 ‘북유럽 디자인 특집’으로 채우는 문화 월간지라니. 아니메에 나오는 촉수괴물처럼 지구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에 과감하게 손을 디미는 그들의 촉수가 부럽고, 그렇게 새로운 잡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두터운 시장과 독자층도 쬐끔 부럽다. 아. 부러운 게 또 하나 있다. 그런 잡지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 이러저러한 나라에 심어둔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주는 월급의 퀄리티.
최근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잡지는 일본판 <에스콰이어>의 2월호 이슈였다. 사진에 빠져 있는 터라 ‘사진이 말하는, 뉴욕의 최전선’이라는 커다란 표제를 보는 순간 침을 질질 흘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고 에디터의 말을 보는 순간에는 머리가 띵 했다. “뉴욕의 거리에 매료된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통해서 시대를 견인하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왔다. 9·11로부터 5년. 다시 활기를 되찾은 사진 도시 뉴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장을 방문하고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과 대화했다.” 그리고 잡지는 바보 같은 섹스칼럼 하나없이 뉴욕 사진작가 50년사, 젊은 뉴욕 작가들 소개 등 잡지의 절반을 스페셜 이슈로 채우고 있었다. 명치가 콕콕 또 쑤셨다.
뭐, 이런 짧은 칼럼을 통해서 대단한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한국 잡지시장이나 독자와 편집자들의 취향 등등을 바꿔보자고 열렬히 주장할 생각도 공력도 없다. 그래도 월급은 조금 올랐으면 좋겠지만 사고 싶은 DVD를 돈 때문에 못 사는 경우는 없으니 그런 대로 살 만하다. 다만 글을 쓰다보니 슬슬 궁금한 게 하나 생긴다. <씨네21> 독자들은, 데보라 카의 추모 스페셜, 혹은 이명세의 <M>에 대한 집중 공략, 혹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액션 명장면 스폐셜, 그렇게 단 하나의 총력 이슈로 절반을 채운 잡지를 반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