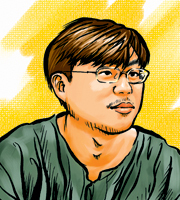<디 워> 열기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이 현상이 지금 한국 영화문화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떨치지 못하겠다. 지난호 영화읽기 코너에 내 생각을 밝혔으니 나머지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다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없는 놈이 쓰게 된다’는 철칙을 끝내 피하지 못하고 이 지면이 내 앞으로 굴러들어왔으며 하루 종일 쓸까 말까 미루는 동안 분노한 편집 및 교열팀이 왜 이리 마감이 늦느냐고 쏘아보고 있으니, 쓰는 게 운명인가보다.
“오히려 <밀양>이 칸영화제에서 큰 상을 탔다고 보러 가자고 말하는 게 직접적인 애국심 마케팅이 아니냐”고 반문한 <디 워> 관계자의 항변을 읽고 적잖이 당황했다. 국제영화제의 수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사대주의적 발상이 지나치게 개입할 때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순수하게 재생과 환영의 시간을 즐기고자 모인 극장 안의 관객에게 상업적 수완의 장면을 덧붙이고 나서 당당하게 “<디 워>에 <아리랑>이 들어간 건 마케팅의 차원”이었다고 말한 쪽의 반문이라면 더욱 그렇다. <밀양>의 라스트 장면에는 반쯤 넋이 나간 여자의 표정과 쓸쓸한 카메라의 이동과 마당에 질서없이 놓여 있는 사물들과 그 위에 떨어지는 조각난 볕이 있었을 뿐이다. 거기에는 마흔 넘어 소설가에서 영화감독으로 진로를 바꾼 이창동의 에필로그와 <아리랑>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더 염려하는 건 상업의 완력 그 다음이다. <디 워>가 방학용 가족영화로서 흥행했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디 워> 현상이 이곳의 영화교육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에 어른들의 마케팅이 개입한 걸 문제 삼아야 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고 영화는 흥행했다. 내가 <디 워>를 본 극장에서는 한 꼬마 아이가 영화가 끝난 뒤 두어번 쑥스럽게 손뼉을 쳤고, 부모는 그 아이가 마냥 귀엽다는 듯 웃어주다 멋쩍게 서로 쳐다보았다. 정겨운 그 가족에게는 한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그들만의 작은 퍼포먼스를 치르고 싶은 마음 혹은 그러해야 한다는 인터넷상의 설파가 있었겠으나, 그 퍼포먼스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물을 의향이 없어 보였다. 그 가족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퍼포먼스는 중대한 결여에 의한 것이다.
지난 7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산하 영상제작센터의 부탁으로 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교육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강의 말미에 그들을 향해 앞으로 관객 문화를 바꾸는 건 청소년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했을 때, 저 약장수 같은 인간이 기어이 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몇 사람을 제외하곤, 그곳에 있던 대부분 현직 선생님들의 눈빛은 이제부터 정말 영화에 관한 생생한 사고를 가르치리라는 열의를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으며, 그런 그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 그들과 혹은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부모로서 교육의 책임이 있는 세대들과 곧 부모가 될 세대들을 향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디 워>는 다만 우리를 둘러싼 영화문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듭 생각하는 문제를 제기해준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아쉽다. 나도 앞으로는 종종 다른 기자들처럼 익살맞고 유익하고 때로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안아주고 싶기까지 한 그런 오픈칼럼을 한번 써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글이 또 이렇게 흘렀다. 마음만 먹으면 나도 익살과 유희를 꽤 떨 줄 안다. 그리고 제발 그러고 싶다. 영화와 영화에 대한 생각이 지금처럼 위험하지만 않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