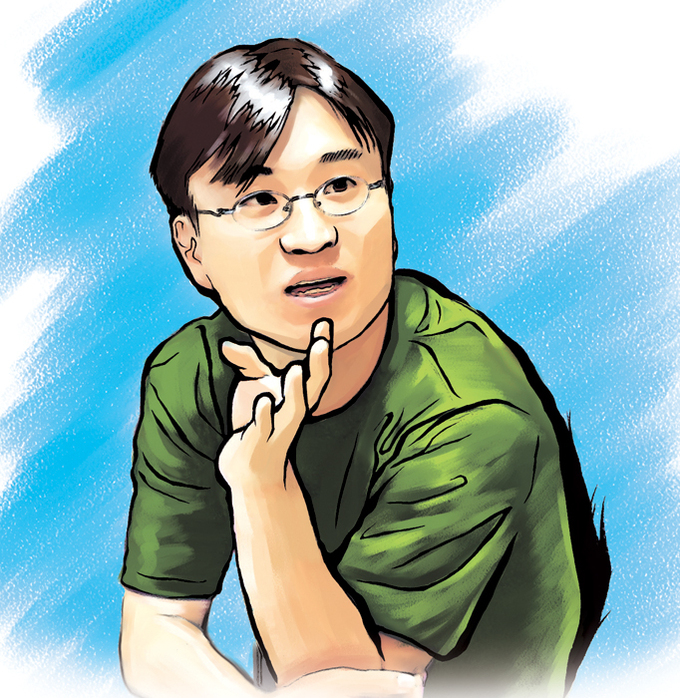난 ‘절라도’ 출신이다. 광주에서 났고, 거기서 20년 가까이 살았다. 흔히 지연은 혈연, 학연과 함께 한국사회를 좀먹는 3대 원흉으로 꼽힌다. 혈연이나 학연은 끔찍이 싫다. 하지만 지연만큼은 좀 남다르다. 대학 다닐 적에 호남향우회로부터 장학금 한번 받아본 적 없다. 우승을 8번이나 거머쥐었던 해태로부터 사인볼 하나 얻은 적 없다. 그런데 왜 그럴까.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다. 다만 ‘광주 만세’를 외치면서도 뒤가 근지럽지 않았던 건, 그곳이 예전부터 잘살았던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못사는 동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잘났다고 떠드는 것보다 못났다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훨씬 윤리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는 어떻게든 고치고 싶었다. 낭랑하고 조근조근한 표준어를 갖고 싶었다. 대학 다닐 무렵만 해도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추정된다. 어쨌든 사투리를 쓰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소개팅 출정시에 상대로부터 “처음엔 고향이 충청도(서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단박에 사투리 흔적을 지울 순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사투리라는 말 꼬리뼈를 떼내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다. 애프터 신청 허락을 따내기 위한 안간힘보다 그게 훨씬 중요했다. 입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사람들보다 화려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지방 출신 선배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조심을 거듭했다.
그랬는데 어쩌다 이제는 사투리 전도사가 됐을까. 거슬러 오르면, 몇년 전 통닭회(통닭부터 회까지, 심지어 삼겹살까지 안주로 내놓는 공덕동 최고의 버라이어티 선술집)에서의 회식 자리가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이미 사투리 꼬리뼈를 떼냈다고 자부했던 그 시절. 새로 입사한 후배들까지 낀 자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과거 유년 시절의 경험을 털어놓다 그만 ‘6학년’을 ‘유광년’이라고 발화한 게 문제였다.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두들 거꾸러졌다. 상처, 꽤 오래갔다. 손가락질을 받기 전까지 ‘유광년’이 표준어 발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진화했다고 믿고 벌떡 직립했는데 꼬리뼈를 감추지 못해 조롱을 당하다니.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했던가. 트라우마로 남을 뻔한 ‘유광년’ 체증을 시원하게 날려준 건 바로 김옥빈이었다.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을 것이다. 인터뷰 도중 ‘절라도’ 출신인 그녀는 ‘6학년’을 ‘유광년’이라고 발음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녀의 웃음 덕분에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던 지역적 자음동화 현상이 이후 자랑스런 상징이 되었다면 과장일까. 요즘 취재를 할 때를 제외하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절라도’ 사투리다. 특히 일부 동료들은 ‘절라도’ 사투리 구사에 ‘절라도’ 사투리로 답변한다. 어설픈 흉내지만 꽤 귀엽고 또 고맙다. 게다가 다음주면 매번 메신저로 ‘절라도’ 사투리를 즐겨 나누는 오랜 친구가 잠깐 귀국한다. “오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