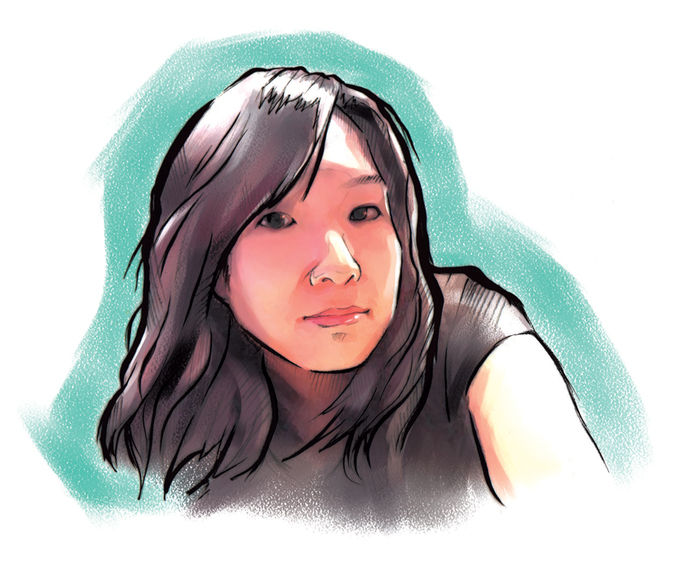지난 주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연락이 끊긴 지 제법 오래인지라 반가움이 앞섰다. 우리는 안부를 나눈 뒤 서로의 새 일터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참 뒤에야 친구는 어렵게 용건을 밝혔다. 대학원에 진학한 지 1개월도 채 안 돼 지도 교수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 잠자리 요구를 거절하고 나니 더이상 조교로 머물 수가 없더라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 진부한 스토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긴 통화를 했다. 그러다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여름, 우리를 끈끈하게 유대시킨 불쾌한 추억도 자연히 화제에 올랐다.
그곳엔 관리자랄까 매니저랄까, 정확한 직책은 알 수 없는 모씨가 있었다. 모씨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배려 덕에 알바는 즐거웠고 허세없이 인생 경험을 조근조근 풀어내는 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다(지금도 그의 순수한 호의는 의심하지 않는다). 신뢰는 그렇게 형성됐다. 그러다 사건이 생겼다. 처음엔 그의 언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애매하게 웃어넘겼고, 그게 성희롱인 걸 알아차렸을 땐 황당하고 억울해서 가슴만 쳤다. 모멸감이란 게 그런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내가 칠칠치 못한 행동을 해서 일을 자초한 게 아닌가’ 자책하는 버릇도 생겼다. 당시 대학 선후배와 함께 몇번씩 뜯어봤던 성희롱 사례집이며 올바른 대처방법 등은 머릿속에 손톱만큼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이 기억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것, 그리고 모씨의 얼굴을 되도록 보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바란 전부였다. 치유를 도와준 건 친구와의 수다였다. 함께 모씨를 욕하며 그에게 쏟아부을 고급 독설을 상상하다보니 어느 새 자책감은 덜해지고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친구는 나를 위로하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는데 그 얘기라는 것도 기가 막히는 것이었다(그의 이야기를 듣자 “소설과 영화 속에 묘사된 여자의 상처는 왜 항상 유년의 성폭행으로 귀결되냐”고 투덜댔던 걸 반성하게 됐다). 그렇게 나는 내가 겪은 성희롱은 사회에선 희롱 축에도 못 드는 귀여운 수준이라는 것도 점차 알아갔다. 가을의 서늘한 미풍이 불어올 때쯤 날카로운 희롱의 추억은 서서히 지나갔다.
첫 오픈칼럼치고는 참으로 상큼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늘어놨는데, 이상하게도 최근엔 이 문제를 생각할 일이 끊이지 않았던지라 이리 돼버렸다. 화제를 좀 전환하기 위해, 본인들에겐 죄송하지만 나는 지난주 오픈칼럼에 등장했던 홍익대 근처 클럽의 두 남정네를 다시금 떠올리기로 했다.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짓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곳이 기회 균등의 원칙하에 자기 매력을 사고 파는 자유시장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상도덕은 있는 법이다. 그들이 선보인 강매의 기술은 가당치도 않았다. 웃으며 사양할까 얼굴을 굳힐까 아니면 과감하게 ㅆ-word라도 날려볼까 고민했지만 이 소심한 성품은 또 애매한 썩소로 몸을 움츠리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 그들만 빼면 그날밤의 유흥은 즐거웠다.
‘그해 여름’의 추억은 신기하게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비슷하게 변주되곤 한다. 적응되지 않는 내가 옳은 거라 생각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