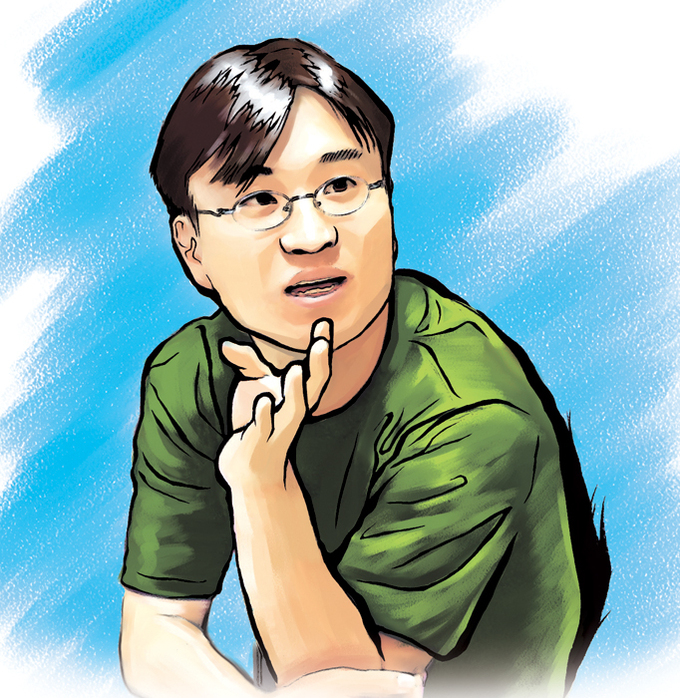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다. 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 한참을 망설이고 주저했다. 1년에 고향 가는 횟수는 많아야 한번, 있어도 3일 이상 머물지 않는 아들에게 잔소리 특강을 쏟는 아버지답지 않았다. ‘이게 바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군.’ 간만에 서울 와서 얼굴 봤는데 아버지 또한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아들 기분 상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나서야 아버지는 어렵사리 결혼 이야길 꺼냈다. 끊임없이 선보라며 처자들을 소개해왔던 어머니가 이젠 지쳐서인지도 모르겠다. 결혼문제만큼은 그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던 아버지가 드디어 운을 뗀 걸 보면. 아버지의 간청은 간단했다. 제발 그냥 다른 집 자식들처럼 평범한 가장이 돼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는 외롭다고도 했고, 그래서 여생을 손자 재롱 보면서 지내고 싶다고도 했다.
전작(前酌)이 없었으면 흘려들었을지 모를 말이었다. 취기에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충고하고 싶었고, 조금은 개겨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결혼은 모르겠으나 자식 낳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당신은 돌이켜보면 좋은 아버지였지만, 난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다고도 덧붙였던 것 같다. 몇번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자신에 대한 원망처럼 들렸나보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키웠던 지난 시간들을 더듬었다. 묵묵히 듣는 일도 쉽지 않은 터라, 나 역시 한국사회의 혈연적 유대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사회적 연대를 더디게 하는 원흉이라고 끼어들어 맞섰다. 고향에서 대학까지 나오는 동안 오랫동안 부모님과 입씨름을 치렀을 동생은 아버지와 형의 연말 설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TV를 보며 맥주캔을 홀짝이고 있었다.
“연애는 하냐?” 잠깐의 휴식 끝에 아버지가 다시 싸움을 걸어왔다. “하다 말다 하지, 뭐.” 몇년 동안 애인이 없다고 말하기엔 적잖이 자존심이 상하는 터라 적당히 둘러댔다. “여자친구 있을 때 집에나 한번 데리고 오지.” 아버진 평소답지 않게 집요했다. “집에 데려가면 뭐가 달라지나”라고 말을 받긴 했는데, 아버진 자신의 상상을 계속 풀어내기 바빴다. “혹시 아버지한테 못 보여줄 사람이랑 사귀냐?” 이건 또 뭔 말인가. 아버지 말은 ‘너, 게이냐?’라는 뜻이었다. 곧장 알아채지 못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의 반응을 살피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아버진 곧장 말을 이었다. “결혼 안 해도 좋다. 누구랑 사귀어도 좋다. 어디 가서 자식 하나만 낳아가지고 와라. 내가 키워주마.” 그 뒤로 한참을 싸웠던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식이 애완견과 다를 게 뭐냐, 라고 반문하면서.
이튿날 아버진 일찍 서울을 떠났다. 비몽사몽 눈곱도 떼지 않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아버지를 봤던 것 같다. 몇 차례 물림 끝에 아들이 내민 몇푼 안 되는 차비를 받아쥔 아버지는 건강하게 열심히 살라는 인사를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다. 간밤의 전투는 모두 잊은 듯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느지막이 오후에 잠에서 깨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버스 속에서 눈을 감고 있을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든 올해는 아들에게 가정을 갖도록 온갖 방책을 짜내야겠다고 맘먹었을까. 아니면 혹시 아들에게 괜한 자기 욕심을 털어놓은 것은 아닐까 후회하고 있을까. 나로선 알 수 없었다. 다만, 친구 같은 아들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약간은 생겨났다. 동시에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주지 못한 그의 미안함도 조금은 전해졌다. 그러고보니, 얼마 있으면 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