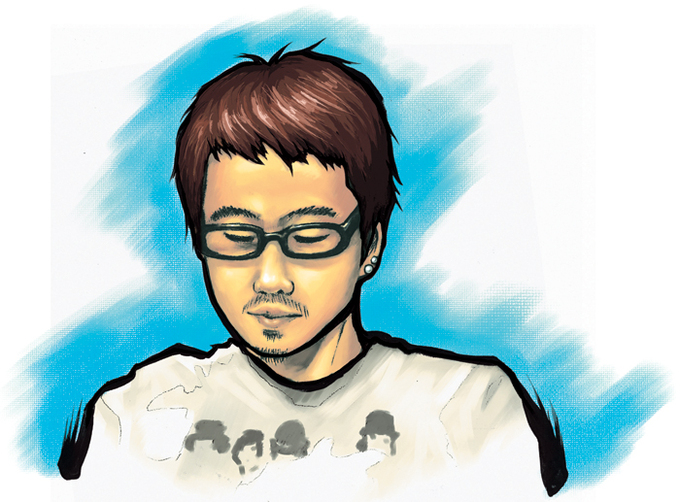카메라를 샀다. 무거운 일안반사식 카메라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디지털카메라는 어째 좀 재미가 없었다. 이왕이면 필름카메라가 좋았다. 이왕이면 작고 가벼운 자동 똑딱이(Point & Shoot) 카메라가 좋았다. 어떤 동네 사람들처럼 일년 중 삼십일을 남프랑스 해변에서 여름휴가로 보내는 호사를 누리는 것도 아니니 이왕이면 조금 값비싸고 좋은 것을 사고도 싶었다. 명품에 대한 욕망에는 ‘허영이지만 사치는 아니다’라는 자기 최면과 자기 합리화도 필요한 법이다.
그리하여 사게 된 것은 미놀타에서 1996년에 생산한 tc-1이라는 카메라다. 듣자하니 발매 당시의 가격이 15만엔에 가까웠고 중고가격도 10만엔에 육박하는 비싼 물건이다. 게다가 ‘the camera number 1’이라는 뜻의 이름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손바닥 반만한 카메라가 손톱만한 렌즈를 통해 만들어내는 사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해 입이 쩌억 벌어진다. 여성의 음부를 튤립처럼 찍어내는 일본의 사진작가 아라키 노부요시 역시 tc-1 예찬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무인도에 렌즈를 하나만 가져가라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라는 바보 같은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한다. “하하하. 재미있는 질문이네. 집에는 대지진을 대비해 미놀타 tc-1과 트라이 엑스 필름 10롤. 그리고 200만엔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 대피시에는 그거 하나만 들고 찍을 거야. 역시 tc-1이라고 해야 할까나. 그놈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좋아. 결국 살아남는 놈은 작고 단단한 놈들이야.” 엉큼한 영감. 옳은 소리다.
tc-1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tc-1은 일본 경제가 버블시대의 절정에 올라 있었던 덕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카메라다. 최상급의 부품과 기능을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속에 집어넣는 모든 제조과정이 수공으로만 이뤄졌기에 제조원가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미놀타에 tc-1이라는 카메라는 팔리면 팔릴수록 오히려 손해를 안겨주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미놀타의 경영진들은 꿈을 꿨다. 버블의 시대를 만끽하던 일본인들이 최고의 스냅 사진기를 소유하는 꿈이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최고의 장인이 만든 최상급의 제품을 구입할 여력과 무모함과 선망과 존경이 있었다. 하지만 버블은 사라졌다. 거품은 가라앉고 가라앉아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미놀타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한 소니에 팔렸다. (필름의 시대가 사라진 탓이기도 하지만) 장사꾼 소니 양반들은 결코 제조 단가를 맞출 수 없는 tc-1의 생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이 틀림없다.
한 시대가 종말을 맞이한 흔적이 티타늄의 갑옷을 입고 내 손에 들려 있다. tc-1은 내게 도호, 닛카쓰, 도에이의 전성기 영화들, 포르셰에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닛산의 스카이라인 자동차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물 건너 섬나라의 지금은 사라진 시대. 영혼과 자본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꿈을 창조해 나가던 장인(職人)의 시대가 남긴 흔적들이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