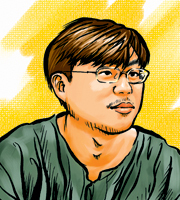12월2일 토요일 밤 <디어 평양>을 보았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동료들이 일찍부터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어쩌다보니 내 삶의 조건과 리듬에 맞춰 그냥 그날 밤 우연히 보았습니다.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눈물을 흘렸는데, 그들과 섞여 있던 나는 문득 울음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씁니다.
거듭 다시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비스듬히 누워 촬영하는 바람에 잠깐씩 잡히던 당신의 발가락, 그에게 용돈을 들이미는 당신의 유쾌한 손등, 그리고 병환으로 굳어버린 아버지의 손목을 강건하게 부여잡는 다시 당신의 손목. 당신의 몸 일부가 그렇게 프레임 안으로 불쑥 들어올 때마다 나는 당신 마음의 공기를 마시는 듯했습니다. 혹은 짓궂게 카메라를 치워버리려 아버지의 팔이 당신의 카메라를 툭 건드릴 때, 그가 탄 느려터진 자전거의 속력에 맞춰 걸으며 내던 당신의 호흡이 들려올 때, 당신들이 닿아 있는 삶의 사이와 거리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영화가 보여준, 만드는 자로서의 ‘나’와 카메라와 대상으로서의 존재 그 사이에서 뛰던 관계의 맥박을 나는 쉽게 잊기 힘듭니다.
나는 물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선택하여 이 영화를 완성한 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도 잠깐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사랑했던 것 그 다음의 것들에 대해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영화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이 이번처럼 큰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과 운이 몇배는 더 긴요해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 지난한 일이고, 손쉽게 하려 든다면 의미를 잃는 일이고, 이번처럼 오래 걸릴지 모를 일이고, 어쩌면 미완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를 카메라에 담은 그때 이후부터 길을 잃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 영화의 미래에 대해 했던 유일한 걱정입니다.
하긴, 말해놓고 보니 무용한 걱정입니다. 어두운 병실 한쪽 복도에 서서 두려움과 자책을 버텨가며 지금 이 순간 유명을 달리 할지도 모를 아버지를 찍어야만 한다고 선택했을 당신을 생각하면 믿음이 앞섭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편지를 본 누군가가 도대체 이 자는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것인가 궁금하여 내기판을 찾듯 오기로라도 당신의 영화를 보러 간다면, 그래서 자기 삶의 반경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울음을 넘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당신의 영화보다 더 훌륭하다 생각되는 영화들의 목록을 올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게 중요한 건, 올해 단 한통의 편지를 쓰는 내가 그걸 지금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 이 영화의 의미입니다.
12월2일 토요일 밤, 나는 가깝지만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의 발가락과 손등을 새벽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내 삶의 거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영화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