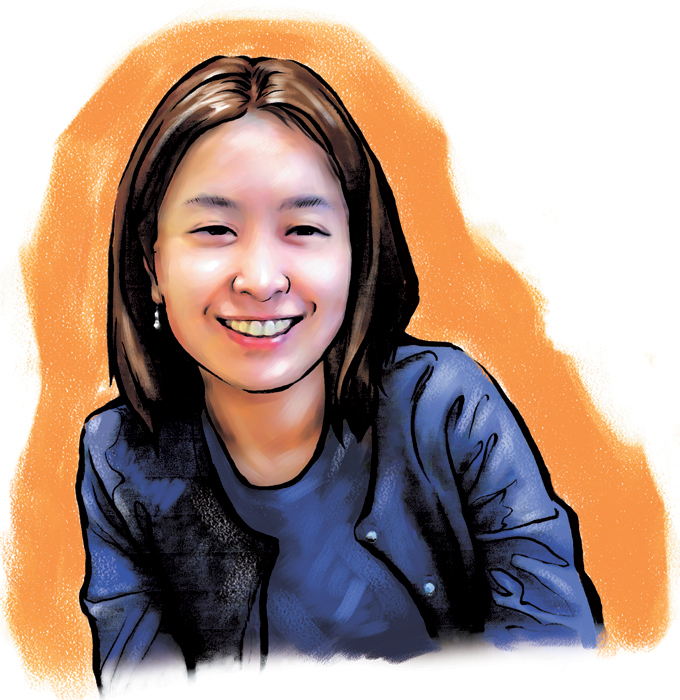주말에 남동생과 서점에 갔다. 모 공과대 기계항공우주어쩌구과 복학생인 남동생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하는 교양수업 때문에 평소에 잘 안 사는 소설을 제 돈 주고 샀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나도 안 읽은 책이다. 우리는 근처 햄버거가게에 들렀다. 음식을 기다리며 책을 뒤적이다 내가 중얼거렸다. “역시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거 같아.” 동생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나도 몇번 써봤지만….” “그렇지.” “뭐? 네가 어떻게 알아?” 놀라서 되묻자 동생은 역시 시큰둥하게 말했다. “햇살만큼이나 우리.”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와하하하하하하!!!!!!!!!!! 정말 미친 듯이 웃었다. 웃지 않곤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햇살만큼이나 우리’는 내가 고1 때 쓴 순정학원물의 제목이다. 중학교 때 감명깊게 본 만화 <점프 트리 에이플러스>를 모방한 소설이다. 내용은 가끔씩 떠올려왔지만 제목만큼은 완벽하게 잊고 지냈었다. 그런데 불쑥 동생 입에서 튀어나온 문구. 햇살만큼이나 우리. 유치해서 죽고 싶었다.
남동생은 내게 “그게 다가 아니지” 했다. 내가 우리집 둘째, 그러니까 내 여동생에게 그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꾸역꾸역 얘기해주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낼 거야”라며 두개의 문장을 읊었다고 했다. 그걸 엿들으며(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와, 우리 큰누나가 고등학생인데 책 내는 구나,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었다고 한다. 동생은 그 두 문장은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햇살만큼이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제목인지를 깨달았는데, 그때 생긴 수치심을 극복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젠 다 극복했으니까 말하는 거지. 근데 그 두 문장은 아직 내가 극복을 못했어.”
수치스런 두 문장은 결국 듣지 못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한들 소용없는 일이다. 실은 말이 그렇지, 나도 떨린다. 햇살 어쩌구만 듣고도 주말 이틀이 내내 괴로웠는데, 무려 두 문장이라니. 그럼 며칠이 괴로워야 하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쓴 제목인데 나라도 아껴줘야 하지 않겠는가. 햇살만큼이나 우리. 그 유치한 감성에 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