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적인 영웅이라는 평을 들었던 해리슨 포드가 소련 군인을 연기했다.
미국적인 영웅이라는 평을 들었던 해리슨 포드가 소련 군인을 연기했다.
캐슬린 비글로 감독과 제프 크로넨웨스 촬영감독은 영화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러시아와 잠수함이라는 낯선 두 공간에 적응했던 과정으로 음성해설의 도입부를 채운다. 그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촬영 4개월 전부터 러시아로 건너가 생존자들을 만나고 촬영장소를 점검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재단의 첫 장편실사영화로서 이미 풍부하게 축적된 관련 자료가 있었지만, 비글로와 크로넨웨스에게 ‘마치 달 착륙 같았던’ 러시아행이 전해준 정서적 영향은 완성된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후 그들이 실제 제작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폐소공포증을 일으키는 잠수함 내부의 재현과 그들과 전혀 다른 세상, 즉 냉전시대의 러시아 군대를 살았던 인간 군상의 묘사였다. 특히 크로넨웨스는 실제 잠수함과 똑같이 좁아터진 세트에서 카메라와 조명의 동선을 매 순간 고민해야 했다는 것을 가장 어려웠던 경험으로 꼽는다. 내부가 너무 좁아서 스탭들이 계속 카메라에 잡히자, 그는 스탭들에게 아예 군복을 입혀 선원 역의 다른 배우들과 뒤섞어버리는 묘안을 쓰기도 했다. 원자로 장면에서 방사능에 의한 특유의 푸른빛을 표현하기 위해 토닉 워터를 조명에 활용한 아이디어도 꽤 재미있다. 토닉 워터 속의 퀴닌이라는 성분이 자외선 조명에 의해 푸르게 빛나는 성질을 활용했는데, 거의 실제와 같은 효과를 냈다고. 또한, 비글로와 크로넨웨스가 여행 도중 만났던 러시아 경찰들이 순직한 동료들을 위해 기념비 앞에 보드카와 빵을 바치게 했던 일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회고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음성해설은 마치 오디오북 같다. 러시아로의 출발부터 잠수함을 거쳐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는 기나긴 여정을 담은 기행문 그 자체다.
 실제 얼음 위에서 촬영한 장면. 마침 날씨가 풀리던 참이라 제작진 모두 긴장해야 했다.
실제 얼음 위에서 촬영한 장면. 마침 날씨가 풀리던 참이라 제작진 모두 긴장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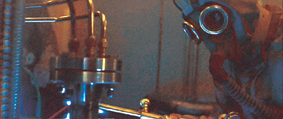 원자로 내부 특유의 푸른빛을 얻기 위해 조명 설치에 토닉 워터를 활용했다.
원자로 내부 특유의 푸른빛을 얻기 위해 조명 설치에 토닉 워터를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