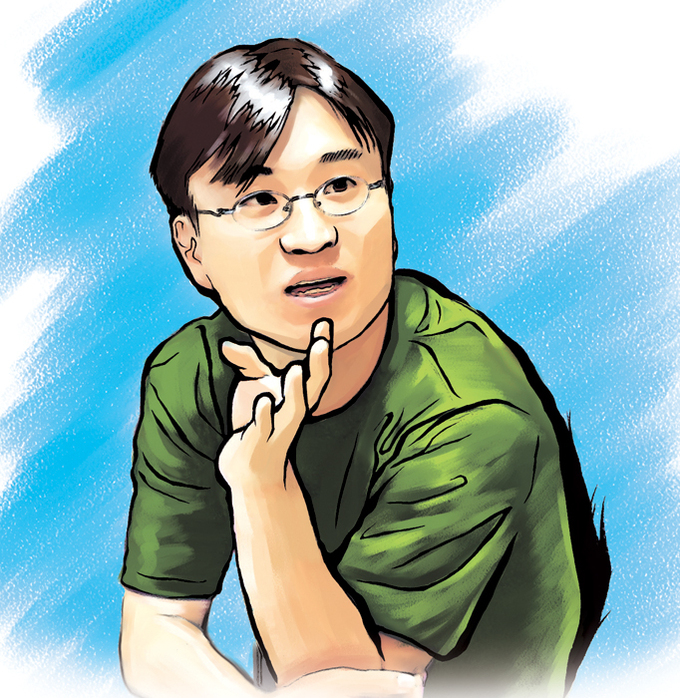비위가 약한 편이다. 사람이든, 책이든, 음식이든. 좋은 건 죽어라 좋고, 싫은 건 죽어도 싫다. 여행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런 촌스런 성향 때문이다. 내 것보다 네 것을 중히 여겨야 하는 낯선 상황을 마지못해 참아내기 싫었다. 그래서 휴가라 할지라도 집에서 뒹굴면서 코앞 회사에 ‘마실’ 나가곤 했다. 하노이에서 머물고 있는 친구가 가이드를 자청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방콕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큰맘 먹고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다. 당 간부 자제들이 유흥을 즐긴다는 나이트클럽 견학도 하고, 베트남식 24시간 감자탕 집도 들러보고. <론리 플래닛>엔 없는 이색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3일째 일이 벌어졌다. 소수민족들이 사는 사파로 가기 위해 밤 기차를 타러 하노이 역으로 가는 길. 스무살쯤 되어 보이는 택시운전사는 어찌된 일인지 같은 거리를 뱅뱅 돌았다. 이러다 기차 놓치는 것 아닌가. 나와 친구는 이러다 기차 놓치겠다며 항의를 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다른 차를 타고 가라는 심산이었는지 그는 한쪽 갓길에 차를 세웠고, 우리는 씩씩거리며 차 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곁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한대가 차 문에 걸려 꼬꾸라졌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100명 넘는 군중이 우리를 에워쌌다. 이러다 멍석말이 당하는 것 아닌가. 어느 동네나 분을 못 참는 이는 있는지 구경 나선 사내 중 한명이 정황을 베트남어로 설명하는 친구의 면상을 갈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안(公安)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더 커졌다. 설명도 안 듣고 다짜고짜 완력으로 자신을 연행하려는 처사가 못마땅했는지 친구가 공안의 명찰을 잡아뜯은 것이다. 친구는 대여섯명의 공안에게 순식간에 목졸림을 당한 채 호송됐고, 난 느림보 시클로를 타고 1시간 넘게 곳곳의 경찰서를 뒤져야 했다. 겨우 찾은 경찰서에서 우린 꽤 소란을 피웠다. 친구는 “호치민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따졌고, 나도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서 관계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너만 카메라 있냐, 나 더 큰 거 있다”는 식으로 어이없이 맞서기까지 했다. 공안도 지지 않았다. 삿대질이 오갔고, 경찰서 안은 베트남어와 전라도 사투리로 어지럽게 얽혔다. 다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경위서를 써낸 택시운전사 청년만이 말없이 그저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새벽에 연락을 취해 직접 달려온 현지 영사의 도움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장과 악수하고 반나절 만에 해방 상태가 됐지만, 무용담처럼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술자리 안주 삼는 일도 슬슬 지겨워질 무렵 짧은 여행도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노이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마지막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그 젊은 택시운전사의 피곤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처음에 우리에게 망가진 문값을 요구하던 그는 그날 한동안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더니 결국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나중엔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반복했다. 영사의 등장으로 더더욱 우리에게 우호적이 된 경찰서장은 그 청년을 두고 “못 배워서 자기 변호 능력조차 없는 친구”라며 동정을 부탁했다. 이제 갓 스무살 넘은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길을 몰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얼마씩 떼내서 차 수리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날 조금 더 서둘렀다면 어땠을까. 서로 웃고 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고 우겼던 그날 새벽. 뭔가 찜찜한 특혜를 누린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 문득 취향이고, 비위고 하는 것들도 덩달아 부끄럽다. 이것 말고 저것이라고 택할 수 있는 건 누리며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 물론 이런 죄의식조차 또 다른 누림을 위한 고백성사일지 모르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