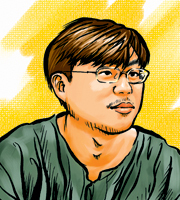존칭은 생략하겠다. 2003년 겨울이었던가, 그가 <씨네21>에 글을 쓰고 있을 당시, 필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먼발치로 그를 보았다. 하지만, 말 한번 섞지 않고 빠져 나온 자리였다. 그렇게 해놓고 존칭을 붙이면 그게 더 시건방진 일인 듯싶다.
소설을 많이 읽지 않는다. 그걸 스스로는 뭔가 경계하기 때문인 거라고 추론한다. 솔직히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읽는다고 방어한다. 김훈도 소설을 쓴다. 그 바쁘신 대통령까지 읽었다는 책을 그 뒤로도 한참이 더 지나서야 읽었다.
나만 그런지는 모를 일이지만, 술을 먹고 하룻밤 의식과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절망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미문들을 읽고 싶어한다는 걸 느꼈다. 미치도록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라 글이라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칼의 노래>를 읽으며 치를 떨었다. 시간의 곰팡이라도 낀 것 같은 멀고 먼 문장의 사이들이 척척 이어지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 “계통이 없다”는 그 말의 반복이 가장 치명적인 매혹이었다. 하지만, 남들처럼 전부 다 찾아 읽지는 않았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읽고 더 빠지면 영향을 받을 것 같았다. 빠져들면 흉내낼 것 같고, 흉내내면 내 몫의 삶을 찾는 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았다. 또 하나는 몸 때문인데, 몸이 자주 아팠다. 병원을 다녀도 의사들은 잘난 척하며 무슨 검사만 하자고 했다. 그의 글을 읽고 나면 가깝든 멀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고, 그 선택을 대면하는 게 싫었다. 어차피 유한한 것을 좀 근사하게 맞이할 순 없을까, 라며 중얼거렸다. 아프고 죽고 하면서도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읽고 있으면 특별히 의학 소견상 별 이상이 없다는 내 몸이 진짜 큰 병에 걸릴 것 같은 미신이 들었다. 그러기에 나는 꽉 차 있지를 않다. <강산무진>을 사놓고도 망설였다.
오사카에 출장을 갔고, <강산무진>을 들고 읽고 다녔다. 그곳 어딘가에서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유품을 보았다. 구로사와 아키라가 생전에 즐겨 쓰던 흰 줄이 둘러 처진 청색 모자, 짙은 선글라스, 갈겨놓은 시나리오를 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의 생각이 김훈의 문장을 얼핏 흉내내고 싶어했다. 어떻게 20세기 사람의 유품과 21세기 소설가의 문장이… 하는 식으로. 여하간, 그때 시간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느낀 것이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싶다. 평생 많고 많은 사무라이를 사랑했던 구로사와의 모자와 선글라스 앞에서 김훈의 연필을 떠올렸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소설가의 책에 대한 단상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에 만들어지는 한국영화 중 김훈의 소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왜 김훈의 글은 어렵지 않은데 심오한 것인가. 왜 그런 우리의 영화는 없는가. 그게 지금 시급한 나의 질문이다. 남들이 전부 말한 하나마나한 소리를 또 한 건 그 ‘개별’의 경험 때문이다. 왜 김훈의 글만큼 두려운 한국영화가 요즘 없는가. 왜 미신의 주술에 걸릴 만큼 강력한 한국영화가 요즘 없는가. 영화기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혹은 <칼의 노래>를 영화로 만들면 누가 좋을까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