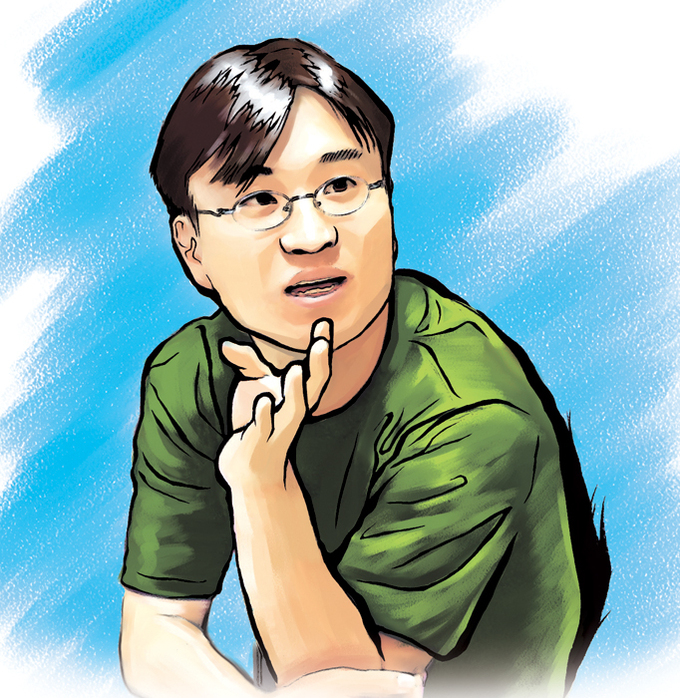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포토저널리즘>이라는 꽤 유명한 책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 생생한 경험과 금쪽같은 조언이 가득하다. 요즘 국내에 쏟아져 나오는 사진 관련 서적들이 대개 폼나는 사진 제조법 전수에 골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국내에서 발간된 최신 개정판을 훑어보면서 좀처럼 잊지 못할 사진 한장과 그에 대한 코멘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근거없는 확신을 대신하고자 한다.
<AP> 소속 사진기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리처드 드류라는 사람이 찍은 문제의 사진은,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뛰어내리는 한 남자를 망원렌즈로 포착한 이미지다. 붕괴 직전, 탈출로를 찾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바깥으로 생명을 날렸고, 이 사진은 죽음을 눈 앞에서 목도해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들 중 한명을 순간적으로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을 대하는 순간, 속으로 ‘이만한 특종이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옆에 실린 자그마한 팁 기사에 따르면, 당시 많은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이 사진을 싣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이보다 더 당시의 상황을 절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진이 있을까, 싶은데도 말이다. 내가 만약 이 광경을 목도했다면 어땠을까. 그만한 순발력이야 없었겠지만, 과연 카메라를 들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저 사진을 게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각하게 밤 새워가며 포토저널리즘의 윤리를 고민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얼마 전 내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고, 한동안 괴로워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다. 사실, 카메라 들고 설치기 전까지는 몰랐다. 아침 6시면, 내가 사는 집 골목 앞에 야채 파는 아주머니가 어김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문제의 그 새벽에도 아주머니는 할머니 한분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밤새 마감을 끝내고 나서 술까지 마신 뒤 귀가(?) 하는 길에 그 광경을 봤고, 그리고 찍고 싶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침대에 널브러졌을 텐데. 그날은 만취한 건 아니었나보다. 카메라를 들고 나와 아주머니에게 다가섰다. 술이 아니었다면 접근조차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왜 사진을 찍고 싶은지 오랫동안 설명했지만, 그건 별 소용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기도 좀 뭣해서, 또 막상 찍다보면 내버려두지 않을까 싶어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아주머니는 싫다면서 손을 계속 내저으셨다. 그만,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그런데도 난 뒷걸음질치며 15분 정도 셔터를 눌러댔던 것 같다.
과연 난 원하는 사진을 얻었을까. 다음날,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보고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불을 쬐다 말고 나를 노려보는 아주머니의 눈은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굳이 그렇게 욕먹어가면서까지 그 아주머니를 찍어야 할 이유가 내게 있었을까. 그 뒤로 아주머니를 집 앞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슬슬 피하게 된다. 물론 아주머니는 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가 저지른 폭력(?)이 말끔히 지워지는 건 아닐 것이다. 혹여 내가 쓴 글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진 않았을까. 마음 열고 고백성사도 했으니, 그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