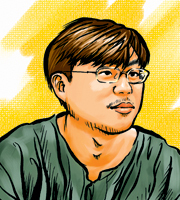나는 <태풍>도, <킹콩>도, <해리 포터와 불의 잔>도, <광식이 동생 광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영화기자로서 너무 태만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어느 쪽도 내가 미치게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다. 그렇다고 극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벌써 주말 2주 동안 근처 멀티플렉스를 찾아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시간표만 들여다보다 집에 돌아왔다. 역시 핑계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은 맞지 않았고, 기다려서 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질 않았다. 가긴 가는데 보고 싶지는 않다… 그건 고통스런 가수면 상태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깻잎머리 소녀는 상대방인 그녀 혹은 그에게 꼭 보아야 할 영화들을 전화로 찍어주고 있었다. “그래, 그 영화 봐라. 그게 진짜 스케일이 커.” 스케일이 커… 스케일이 커… 몇초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오며 그 소리가 메아리쳤다. 영화의 스케일과 여러분의 영화 선택의 자유는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하게 반비례의 함수관계다. 스케일이 큰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간 돈만큼 많은 관객이 찾아야 하고, 관객을 부르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되도록 그것을 보도록 대량으로 극장을 차지하는 것이다. 극장에 간 여러분은 그걸 볼 가망성이 클 수밖에 없다.
점프컷. 만약 여러분이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여기도 저기도 같은 연극만 한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사고 싶어 서점에 갔는데 온통 톨스토이만 깔려 있다면, 만약 하루라도 그런 일이 대학로와 서점에서 벌어지면 당신은 세상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점프컷.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누군가가 이런 농담을 했다. “프랑스 사람은 모두 자기 직업이 두개라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는 원래 자기 직업이고, 또 하나는 영화평론가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다.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필사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 새우잠을 자고, 극장과 극장 사이를 달리는 부산영화제의 열혈 관객이 그 순간 떠올랐다.
전국 스크린 수 1500여개 중에 87%인 1300여개에서 네편의 영화를 상영한다(<씨네21> 533호 국내리포트)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러나 정색하고 산업적으로 그걸 분석해내는 건 내 전공도 아니고, 이런 감성적인 지면으로 말해서 될 일도 아니다. 대신 나는 상식을 도구로 말하는 중이다. 나는 관객을 위한 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편이지만, 관객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수없이 많은 무정형의 개인들이 영화를 고를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관객이란 도스토예프스키도, 톨스토이도, 그 밖에 무엇도 읽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부산에서 극장과 극장 사이를 날아다니며 영화를 섭렵하던 관객은, 여러분은 영화의 스케일을 재는 사람이 아니라 두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그 순간 당신의 직업은 영화평론가인 셈이다.
부산영화제에서 10일간 맛보던 행복을 1년간, 10년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불평하는 것밖에는 없다. 왜 이 영화는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영화는 없는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이트에, 블로그에, <씨네21>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다. 잡지를 만들어 먹고사는 우리는 여러분보다 앞서 있는 척하지만,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는 건 여러분이다. 한해가 가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여러분의 불평이 그립다. 선동이냐고? 선동이다. 어… 선동은 내 타입이 아닌데, 누가 내 머리에 끈을 묶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