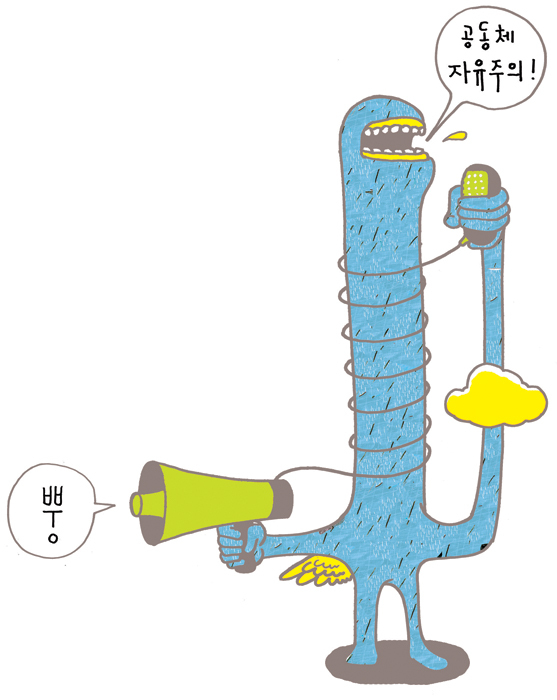‘공동체 자유주의’라는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에서 갑자기 들고나온 이 표현이 졸지에 한나라당의 이념이 되어버릴 모양이다. 사실 이 말처럼 허무한 표현도 없을 것이다. 그 표현은 ‘A=A’라는 동어반복처럼 아무 내용이 없는 명제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A=~A’라는 명제처럼 서로 모순되는 명제이다.
먼저 왜 ‘동어반복’인가?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 그보다 좀더 자유주의적인 앵글로색슨 국가들까지, 현존하는 모든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체제다. 따라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을 다른 세력과 구별하는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공동체적 요소와 자유주의적 요소의 배합인데, 특정 정치세력의 정체성은 바로 이 배합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개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대충 얼버무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실의 정책에서는 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버스사업을 ‘준공영제’로 바꾸었다. 철저한 자유주의자라면, 이것이 버스 사업체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하여 반대할 것이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라면 버스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띠므로, 준공영화로 더러 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를 환영할 것이다.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른바 뉴라이트의 ‘공동체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까?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두개 다 하겠다고 하니, 대답도 두 갈래로 나갈 수 있다. 만약 버스 준공영화를 노무현 정권이 했다면, 그들은 자유주의자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버스 준공영화는 버스 사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세금을 잡아먹는 사회주의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치는 우연히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의 것이었다. 이를 어떡한다? 이때 그들은 곧바로 공동체주의자로 돌변한다. 자신들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버스 사업의 준공영화는 지나친 시장원리의 남발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수정하는 이른바 ‘공동체주의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얼마나 편리한가?
몇번의 토론회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전국연합’이든 ‘네트워크’든,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공동체주의-자유주의’ 논쟁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러니 그 두 원리를 결합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실천적, 이론적 문제가 따르는지 알 리도 없다. 그래놓고서 사상운동을 하겠단다. 뉴라이트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봐도, 막가는 하이에크주의에서 다단계 판매 두레공동체주의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나마 ‘공동체적 자유주의’에 대해 개념이라도 가진 것은 ‘안민포럼’이라는 곳. 이들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의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는 것을 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이 제출한 것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자유주의는 대처나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옮겨온 어떤 정책이 이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말도 허무한 것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는 바로 노무현 정권의 문제이고, 그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 그렇다면 ‘공동체 자유주의’는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펴는 정책의 이름이 된다. 그런데도 뉴라이트는 공동체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의 재집권을 막겠다고 외친다.
맹구가 따로 없다. 그 애국적 맹구들이 내지르는 구국의 함성. “맹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