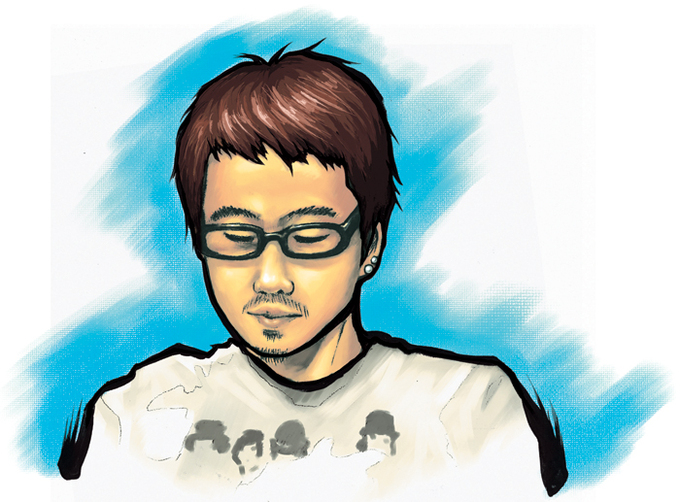토머스 스튜어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 나라는 인종차별주의자들로 가득해. 네가 떠난 뒤로 많은 것이 변했어. 다른 인종들끼리는 긴장과 공포와 미움만 가득하고,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며 행복해하고 있어. 리틀 브러더. 네가 그립군.” 톰은 여전했다. 편지를 받은 4일 뒤에 짐을 쌌고, 10여 시간을 갇혀 날았다. 연착으로 경유지인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것은 예상보다 4시간이 지난 뒤였다. 스키폴 터미널을 냅다 달렸으나 비행기는 떠나고 없었다. 비행사에서 나눠주는 슈퍼-슈퍼L사이즈 양말(털모자인 줄 알았다)과 칫솔세트와 무료 숙박권을 들고 도착한 곳은 오리가 꽥꽥대는 암스테르담 교외의 호텔이었다. TV는 파리 교외에서 벌어지는 폭동을 보여주며 떠들어댔다. 파리는 네덜란드어로 불타고 있었다.
브리스틀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아침 10시. 데보라의 3층집 지붕 아래 누우면 별이 보이는 다락방에서 빨강머리 앤처럼 아흘을 살았다. 갑갑하고 유채색이 촌스러운 홍익대 앞 클럽용 복장이 아니라, 나흘을 입고 뒹굴다 나온 듯한 국방색 윗도리에 떡진 머리를 한 젊음들이 모인 클럽에서 떡진 머리의 청춘들을 만났고, 이틀을 이집 저집 아는 집 모르는 집 전전하며 지내다가 이틀을 앓아누웠다. 4시면 해는 져서 캄캄했고, 비는 멈추지 않았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고, 머리는 으깨질 것 같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다. 몇몇 친구들은 콘월로, 서섹스로, 에든버러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전화로 알려왔고, 가르치던 악마 같은 아이들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2년 전 일했던 위탁교육 회사는 회장 폴 헤이스(Wanker)의 횡령으로 주저앉았고, 60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었고, 아이들은 영국 곳곳의 교육기관으로 자의에 관계없이 보내졌다. 데보라는 말했다. “만나지 않는 것이 걔네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오히려 그애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나는 영국인의 이성이, 끈적한 한국인의 정보다 아이들을 돕는 데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고, 슬퍼졌다.
남은 날은 가끔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었고, 펍에서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반씩 섞은 샨디를 마시며 노가리를 깠다. 집에 머무른 날은 DVD를 보거나 모닥불 옆에서 뒹굴거리며 턴테이블을 돌렸다. 마지막날 밤에 잡아탄 택시의 파키스탄 출신 기사는 얼마 전 영국 제2의 도시인 버밍엄에서 일어난 아시아-아프리카계 유혈충돌에 대해 떠들어댔다. “정부가 문제야. 경찰이 일부러 거짓정보를 흘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14살 난 흑인 여학생이 파키스탄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해적방송의 뜬소문 때문에 두 인종이 충돌했고, 2명이 죽고 35명이 다쳤다. 버밍엄도 불타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토머스 스튜어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잉글랜드가 싫어. 이 나라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악마 같은 인간들로 가득해. 공포와 미움이 가득하고,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어. 리틀 브러더. 남한으로 갈 테니 기다려줘.” 톰은 여전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날아, 갓 출근한 직원들 옷에서 대마내음이 그윽하게 풍겨오는 행복한 금연금지 스키폴 공항에서 5시간을 머무르다, 10여 시간을 날아 인천에 내려앉았다. 서울은 오래전에 불타고 남은 잿빛이었다. 잊고 있었나. 질질 끌고가던 26kg짜리 여행가방을 잿더미 속에 휙 하고 던져버리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