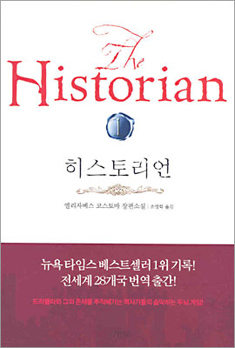과거로 돌아가 마음대로 직업을 택할 수 있다면, 나는 사서가 되고 싶다.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책을 만나고 읽어보는 일은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운 일이다. 어렸을 때, 최고의 판타지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한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것이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둥실 떠다니는 먼지까지도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렇게 살고만 싶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엘리자베스 코스토바의 <히스토리언>을 읽으면서, 사서들이 존재하는 거대한 도서관 혹은 박물관에 유난히 눈길이 간 것도 그런 이유다. <히스토리언>을 집어든 이유는 물론 드라큘라 때문이었다. 드라큘라의 역사와 신화를 집대성했다는 말에 혹해, 무작정 읽기 시작했다. 터키에 드라큘라의 머리가 옮겨졌다는 등 알지 못했던 드라큘라의 이야기들을 들은 것은 좋았다. 하지만 <히스토리언>은 드라큘라를 둘러싼 현대판 판타지나 모험소설은 아니었다. 과거의 역사를 곳곳에 끼워놓은 인문지리지 같았다고나 할까. 등장인물들이 유럽의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전해주는 풍경이나 인상 같은 것들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드라큘라를 비롯한 흡혈귀들이 나오긴 하지만, 서스펜스는 거의 없다. 그냥 착실하게 드라큘라를 쫓는 자들의 운명을 전해주는 것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히스토리언>에 나오는 많은 사서들이 죽거나 흡혈귀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서)들의 슬픈 운명이 학문의 근원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연구 과제 때문에 기꺼이 지옥의 문이라도 열게 되는 역사가들도 마찬가지다. 꼭 거창한 학문이 아닐지라도, 무언가에 매혹된 이들은 쉽게 나락으로 빠져든다. 절대적인 진리는, 결국 위험한 몽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수많은 나라의 전설에 등장하는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 모두 극도로 타락했거나 적어도 사악한 방식으로 불후의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다르게 보자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가 끝없는 반복과 그로 인한 비극으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드라큘라이며, 추악한 불멸의 존재이다. 우리 모두의 얼굴이기도 하고.
<히스토리언>의 사서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은, 코스토바의 말처럼 필연일 것이다. 그 추악한 영원의 존재를 만난다면, 아마도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추악한 영원을 택하거나, 장엄하게 죽어가거나. 어느 것도 싫다면, 그냥 살아가는 법도 있을 것이다. 영원을 만나지 않고,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누구는 동물 같은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더 자연주의적이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든다. 뭔가 이상이나 진리 같은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면서, 세상이 추악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허튼 생각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