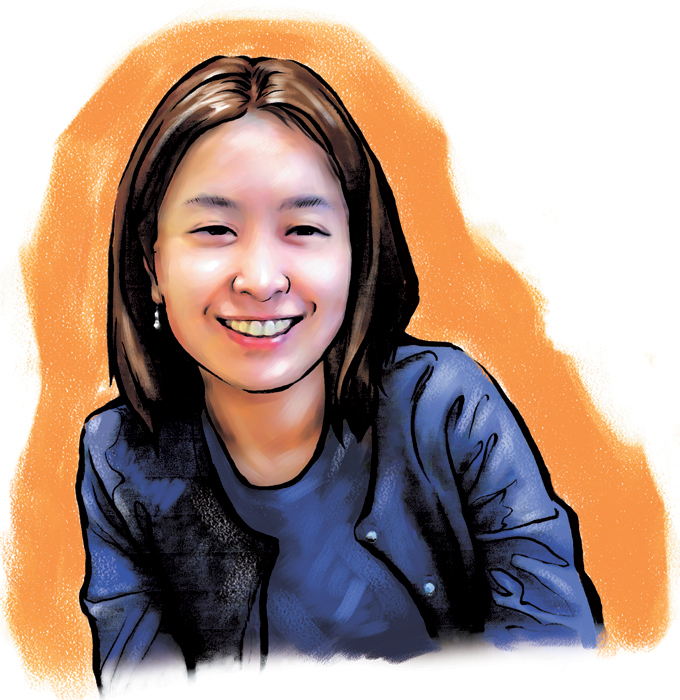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장을 한다고 내 아는 사람이 그랬다(정확히 자기 ‘가장’이란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다. 본인한테 확인했는데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단다). 그의 말뜻은, 실제보다 자신을 밝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보다 자신을 예민한 성질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보다 우울한 태도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다. 부산영화제를 다녀온 뒤 1주일 내내 난 조증이었다. 심하게 조증이었다. 한톤 반 높아진 목소리로 종일 깔깔거리고 실실거렸다. 일 의욕까지 넘쳐 담당 영화기사를 “죽을힘을 다해 써보겠다”고 했다. 한 선배가 물었다. “너 무슨 좋은 일 있지?” 부산영화제 데일리팀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는 담배를 문 채 반대로 말했다. “네가 지금 우울해서 그런 거 아냐?”
우울해질 만큼 바다가 그리워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대답이었다. 물공포증이 심해서 지난해 겨울에야 수영하는 법을 배웠고, 좋아할 수 있는 대상 축에 바다를 넣어본 적 없는 내가 영화제 막바지 무렵 어느 날 정오, 해운대의 눈부신 자태에 홀리고 말았으니까. 바다는 자기 세상의 전부가 나인 것처럼 내 앞에서 외롭게 빛났다. 내게 닿고 싶었는지 처량한 헛걸음질을 되풀이했다. 바다의 몸부림이 그렇게 로맨틱하고 유혹적일 줄이야. 백사장에 주저앉아 맨발을 묻고 있으니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좋은 고백을 받은 사람처럼 심장이 콩콩거릴 뿐. 사랑에 막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와,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쨍한 낮 바닷가에서 우연한 재회에 반가워하며 건넨 내 인사를 받은 그 사람은 어두워진 저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밝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고. 변명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내가 ‘알고보니 순수하지 않은’ 인간임을 탓할 뿐이었다. 우리는 바다를 믿지 말 걸 그랬다. 바다는 햇빛을 반사하고 바람을 실어나를 뿐이다. 아무 앞에서나 초롱초롱 빛나고 아무 앞에서나 아이처럼 매달린다. 넓고 오래된 바다는 분명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애해왔을 것이다. 내가 아무 앞에서나 반갑게 웃어대듯이.
바다 없는 서울의 여백이 현실을 일깨운다. 더이상 쓸모없어진 장독 안에 대책없이 고인 낡은 빗물처럼, 내 마음에 물이 고인 것을 알았다. 오래된 것 같다. 토할 것처럼 차오른 물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버려야 할 것이 물인지 그것을 더럽힌 부유물들인지조차 모르겠다. 새벽종보다 맑다고 믿었던 내 진심어린 말들의 공명이 물에 젖어 아무 울림도 만들지 못한다. 물 마를 때가 오겠지. 퍼렇게 시커멓게, 낮이 기울고 밤이 떠오르는 날들을 헤아리다보면. 빠른 구름은 삼킬 수 없을 테니, 느린 별들이라도 여기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