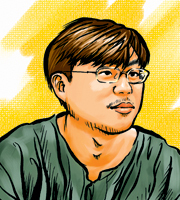국민과 시민과 인민과 대중과 군중과 사람과 인간과 이웃(과 여기 더 이어붙일 수 있을 또 어떤 것들)의 차이가 무엇에 있는지 가끔 자문자답하고 싶어진다. 자주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 언뜻 떠올리고 나서는 또 금방 잊고 산다. 전유하고자 하는 입장에 따라 이미 곳곳에서 의미를 배치받은 말들이어서 분류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선을 그을 수 있을 테고, 인류가 살아온 치열한 궤적을 돌아볼 때 그 말이 혼란스럽다고 묻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어 보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일렬로 엮여서 동시에 떠오를 때는 그 각각의 정의 또는 통합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무용함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관객’을 위한 영화를 만든다는 그 쉬운 말을, 나는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박광현의 <웰컴 투 동막골>, 허우샤오시엔의 <희몽인생>, 에드워드 양의 <독립시대>, 장 뤽 고다르와 장 피에르 고랭이 주축이 된 지가 베르토프 집단의 <동풍>을 며칠 차이로 다시 보거나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언뜻 또 뒤죽박죽 한 것 같다. 이 네 영화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며칠 동안 본 영화 중 이 네편이 같이 떠올랐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좀더 정확히는 <웰컴 투 동막골>의 지루함을 견디던 시간 동안, 근접해서 본 다른 세편의 잔영이 두서없이 끼어든 것이다.
오직 태어나는 것과 죽어나가는 것만으로, 들어서는 것과 물러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요람과 무덤 혹은 진입과 퇴거만으로 여러 인생사를 수렴하고 있는 <희몽인생>의 놀라운 간명성. 여러 인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두명의 인물만 번갈아가며 한 프레임에 살도록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독립시대>의 눈치차리기 힘든 슬프고도 절실한 투숏의 연쇄. 영화를 영화 아닌 것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로 영화 자체의 형식을 혁신하는, 때문에 언제나 영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화의 한계를 몸소 토로한다는 의미로서만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다르와 그의 <동풍>의 이미지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웰컴 투 동막골>의 순진무구한 그 마을로 난데없이 팝콘처럼 쏟아져내렸다.
나는 평이한 형식으로 나타난 <웰컴 투 동막골>의 휴머니즘적 원론성의 전략을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나로서는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명한 그들에 관한 정의를, 나머지 세편의 영화는 부분적으로만 성취한 그들에 관한 정의를, 즉 관객에 대한 정의를 이 영화는 뭔가 자신만만하게 갖고 있었다. 그걸 지탱하고 있는 것이 휴머니즘적 원론성의 전략이다. 물론, 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생긴 판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근거가 상념에 빠뜨리는 걸 막지는 못했다. <웰컴 투 동막골>의 수치적 승승장구 앞에서 국민과 인민과 시민과 대중과 군중과 사람과 인간과 이웃과 그리고 관객의 무형의 경계에 대한 물음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이 한편의 영화를 보다가 나머지 세편의 영화를 생각하던 나는, 영화의 형식이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론적 규정과 통합의 반복을 피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점을 그 어딘가에 속해 있는 우리도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웰컴 투 동막골>이 특별히 미워서 하게 된 소리는 아니지만, 여하간 관객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을 거는 형식만이 원론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제해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믿게 됐다. 추석인데 딱딱한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고, 나도, 누군가도 즐거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