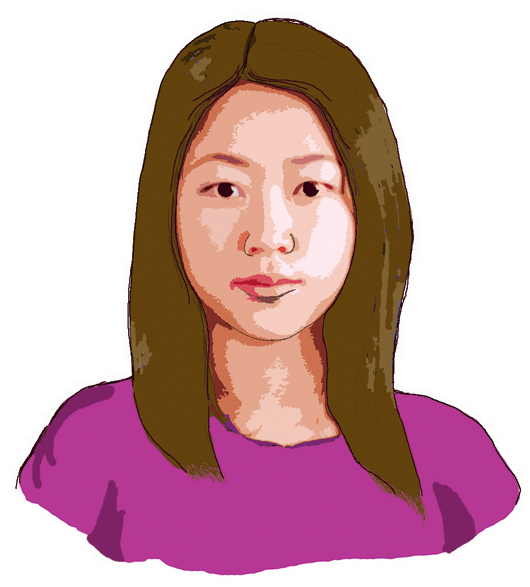지난해 새해 벽두에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모 경찰서 소속이라고 밝힌 형사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혜화동 노부부 살인사건을 아십니까? 구기동 살인사건은요? 그럼, 신사동 살인사건은요? 무슨 일이신데요? 세 사건 발생 직후에 해당 지역을 지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뇨, 모월 모일 모시에 모 버스를 타셨던데요, 또… 모월 모일 모시에도…. 그럼, 제가 살인 용의자란 말씀이세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시간되시면 서로 나와주십쇼. 시간없는데요.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머릿속이 아득했다. 교통요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다니,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구나 좋아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누군가 조회를 하고자 하면, 이렇게 샅샅이 알아낼 수가 있었다. 음… 이게 말로만 듣던 과학수사인가보군. 신기한 생각도 들었지만, 불쾌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회사로 찾아온 형사는 세번 이상 범행 시각에 사건현장을 지나간 이들을 찾아다니며 탐문 중이라고 했다. 살아오면서 추첨 같은 확률 이벤트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세건의 교집합이라, 별일이 다 있다 싶었다. 한편으론, 혹시 내가,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다크포스에 사로잡혀 그런 짓을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든 사이,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멍해지는 가수면 상태에서, 내 안의 사악하고 흉포한 영혼이 유체이탈되어 무력한 노인들에게 잔인무도한 폭력을….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형사는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내밀었다(나중에 그게 유영철의 뒷모습인 걸 알았다). 오빠 있어요? 남자친구는요? 그분들 전화번호는요? 그러니까 나는 용의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여동생이나 애인 선에서 수사를 받은 거였다. 못 가르쳐주겠다고 버티자, 형사는 포기했다. 대신 조언을 달라고 했다. 직업상 영화와 책을 많이 볼 텐데, 교회 앞 단독주택, 노부부, 둔기 살인의 공통점이 있는 이 연쇄살인에서 유추할 만한 단서가 떠오르냐고 했다. 그 얼굴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웃음으로도 얼버무리지 못하고, 생각나면 연락하겠다는 기약없는 말만 남기고 헤어졌다.
수개월 뒤에 유영철이 잡혔다. 영화에서 음으로 양으로 힌트를 얻으려는 수사진의 노력은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도 계속됐다. 유영철에게 살인 방법과 사체 처리법을 일러준 것이 잔인한 만화와 소설, 그리고 ‘영화’라고 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이 그의 집에서 발견된 <베리 배드 씽>의 영화 테이프였다. 뉴스에선 전기톱을 든 채 웃고 있는 크리스천 슬레이터의 사진이 실린 비디오 재킷을 친절하게 클로즈업해 보여주었다. 발딛고 서서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보다는 불켜지면 날아가버리는 스크린의 허상에 밀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까. 나는 이렇게 영화를 ‘범죄 메뉴얼’ 취급하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억울한 심정이 되곤 한다. 유영철 사건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미진했던 수사를 만회하고자 하는 변명처럼 느껴진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혹시 영화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순수한 이상주의자들인 것일까. 앞으로도 쭈욱, 누군가는 현실에서 영화를 읽으려 하고, 다른 누군가는 영화에서 현실을 읽으려 할 것이다. 그들이 그러듯 나도 내 길을 가련다. <CSI 과학수사대>를 틀어놓고, 진정한 과학수사는 저런 것이란 말이지, 혼자 흥분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