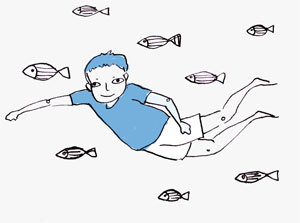강의 상류엔 우리의 꿈이 있었다.
강의 위쪽으로 주욱 올라가면… (물론 물을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우린 연어가 아니니까)… 버스 타고 올라가 조금 걸어들어가면 강의 상류와 만난다.
오후 다섯시가 되면 동네의 건아들이 그곳에 다 모였다. 내가 굳이 건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 확인은 없었지만 그곳에 여자 학우들의 모습은 단 한번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곳에 모인 건아들의 맘속에 한 가지의 소망들로만 가득했다.
강을 건너리라~.
다섯시 반이 되면 강의 상류 그 위의 물벽을 틀어막고 있는 댐의 일일 방류가 시작된다.
그러면 상류의 물살은 몇곱으로 빨라질 것이고 우린 그 물살에 몸을 띄워 그 힘으로 강을 건너리라.
우리의 맘속에 똑같이 새겨놓은 횡단의 꿈은 그 당시 조오련이 보여준 대한해협의 가로지름과 맞먹는 것이었다. 강의 저 건너에 어떤 신기함이, 돈 될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저 저 강은 어느새인가부터 동네 또래들의 가슴속에 커다란 꿈으로 자리했고 우리의 꿈은 대통령도 장군도 사장님도 아닌 “강을 건너리오!”였다.
물론 이 꿈은 계절적인 영향이 있었다. 날이 더워지는 여름엔 우리는 모두 “강을 건널 거요!”를 외쳤지만 날이 추워지고 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꿈은 다시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사장님이요”, “임꺽정이요” 등으로 바뀌었다.
가끔 드물게 눈내리고 강이 언 겨울에도 “강을 건널 거요”라고 부르짖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지만… 동료들이 자신들을 보고 손가락을 세워 귀 근처에서 원을 몇 바퀴 그리면 금세 제정신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최고의 바람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물론 희생도 따랐다. 초등학교 4, 5학년 즈음이던 우리는 강의 건너편 육지에 발을 딛기 위해 동료들의 죽음도 맛보았다.
어제 내 옆에서 물살을 가르던 김군이 보이지 않고 김군의 친구들은 검은 리본을 러닝에 꽂고 나타나 죽은 친구의 영혼 앞에 내가 너 대신 건너리라, 주먹을 불끈 쥐곤 했으니….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만 한강 가서 헤엄치면 아주 패죽일 거라며 주먹을 불끈 쥐시던… 그리하여, 물론 초등학교 4, 5학년 즈음의 건아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음주 뱅소니를 치는 것보다 한강에서 헤엄치다가 걸리는 것이 그 당시엔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이었다.
그랬다. 우리의 꿈이 초롱하던 그 시절… 강의 물살은 우릴 불렀고 우린 그 부름에 의심없이 발을 담궜다. 우리의 헤엄이 물살의 힘을 등에 업고 팔다리가 강의 정기를 타기 시작하면서 우린 드디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린 드디어 꿈을 이루어냈다.
하나 꿈을 이룬 우린 다신 그 꿈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린 어렸다.
서울에서 강으로 들어간 우린 뭍에 닿을 땐 그곳이 경기도라는 걸 알 수 없는 나이였다.
“드디어 우린 강을 건넜네.”
“그래, 꿈을 이룬 것이지 으하하.”
“그런데 가만, … 여기가 어디지?”
오후 다섯시 반에 쏟아지는 물살을 타고 강을 건넌 우린 해가 지고 꿈을 이루었다.
다만, 다시 강을 건너가기에 힘이 너무나 빠진 우린, 밤 열두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
각자의 부모님께 각자의 집에서 거진 비슷하게 두들겨맞은 얘긴 아무에게도 해줄 수 없었다.
장진/ 영화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