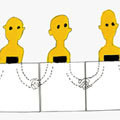4월15일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접었다. 그동안 ‘논객’으로서 그 당에 공개적 지지를 표명했던 것은, 이 땅에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진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보정당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수와 중도까지도 동의하는 시민적 합의.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한 이상 나의 공적 지지도 시효가 다 한 셈이다. 그리고 오늘, 한명의 유권자로서 그 당에 대한 사적 지지마저 ‘당분간’ 접는다. 사실 민주노동당을 나온 것은 2년 전의 일. 그때 ‘탈당’이라는 수단으로 내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만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당직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이른바 ‘NL’이라는 세력이 주요 당직을 모조리 독점한 것이다. 당원의 대다수는 NL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 커다란 불신을 갖고 있는데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것이 21세기형 민주주의인가? 평당원들은 원자처럼 분산되고, 이른바 좌파들은 이리저리 분열되고, 그 틈을 타서 당내에서 늘 말썽이나 부리던 정파가 세팅선거에 조직표로 당직을 싹쓸이하는 게 21세기형 진보란 말인가? 오늘로써 민주노동당은 ‘당분간’ 죽었다.
민주노동당에 ‘주사파는 없다’고 했다. 언제까지 유권자를 속일 생각인가? ‘주사파 있어도 끄떡없다’고도 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사파도 바뀔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일종의 사이비종교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종교적 신심이 어디 쉽게 바뀌던가? ‘주사파와 NL은 다르다’고도 했다. 그래, 그래서 제발 그 ‘다름’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투표를 하거나 노선을 결정할 때, 주사파와 NL이 그동안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었던가?
북조선의 인민보다 북조선의 권력을 더 걱정하는 이들, 남한의 사형제도는 인권침해이나 북한의 것은 혁명을 옹위하는 정당한 수단이라 말하는 이들, 동성애자가 “자본주의의 파행적 현상”이라는 이들, 노래 한 자락 부르는 데에도 지도원 동무 허락받는 것을 집단주의의 미덕이라 칭송하는 이들이 진보정당의 지도부란다. 당에 들어와 툭하면 지구당이나 집어삼키던 종파주의자들이 당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민주노동당은 더이상 서민의 정당이 아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다 망해가는 어느 봉건권력의 그림자일 뿐이다. 당을 이 꼴로 만들어놓고 유권자들에게 표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가?
명색이 공당에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누군가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해 그 실질을 배반하는 이른바 “사람 사업”을 해도, 진짜 민주주의자는 그 악용되는 형식조차도 존중하고, 그것을 실질화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번 사태를 쓰라린 교훈 삼아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붙어다니는 시대착오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수년간 지켜본 바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저들의 최종목표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며, 아마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21세기에 그 목표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이다.
극우파는 주사파의 오류를 먹고살고, 주사파는 극우파의 잘못을 먹고산다. 둘은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공생의 관계에 있다. 이 시대착오를 재생산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 이 빌어먹을 법 때문에 진보진영이 주체사상이라는 반동을 스스로 걸러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체주의자들은 제 정체성을 속이는 사기와 기만을 접고, 정직하게 커밍아웃해야 한다. 적어도 사회주의자들은 국보법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했었다. 진중권/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