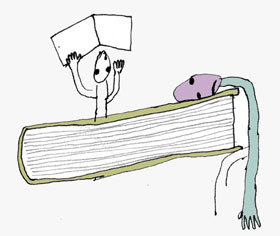종이 위에 글로 씌어진다고, 아니 모니터상에 활자로 박힌다고 모두 같은 글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류와 책은 아주 다른 계통에 속하는 글이어서, 그것을 쓰는 데 아주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나는 논문이나 책을 쓰는 데는 매우 숙련되어 있어서, 글 한편 쓰는 것은 별로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미숙해서 너무도 고생을 한다. 반면 학교나 관청의 관료들이라면 정반대일 것이다.
서류나 문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내용을 써넣을 것을 요구한다. 갖추어야 할 서류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영락없이 퇴짜다. 반면 논문이나 책은 남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동일한 형식으로 쓰면 욕을 먹는다. 가능하면 남과 다른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해야 하며, 쓰는 스타일도 남다른 면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의식과 주장이 선명하기만 하다면, 표현이나 형식에 어떤 결함이 있어도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글을 읽는 데도 이처럼 아주 다른 두 가지 계통이 있다. 하나는 시험을 위한 독서고, 다른 하나는 시험과 무관한 독서다. 시험을 위한 독서는 정해진 답을 기억해야 하는 독서이고, 따라서 남과 동일하게 읽어야 한다. 남다른 관심을 갖고 남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읽으면 시험은 망치기 십상이다. 시험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눈이 아니라 출제자 내지 채점자의 눈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이미 정해진 답 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읽고 생각해야 한다.
소련 붕괴 이후 복학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시공부를 하던 후배가 있었다. 그는 고시공부를 하다가 법학에 흥미를 느껴 교재 아닌 다른 책들이나 법철학처럼 시험과 상관없는 책을 찾아 읽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시험과는 아주 멀어져 있더라면서 결국 시험공부를 때려치웠다고 했다. 그처럼 관심이 다른 관심을 ‘새끼를 치는’ 사람은 고시공부로 성공하기 힘들다. 시험을 위한 독서는 표준화된 답에 맞추어,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과 깊이에서 딱 멈추어야지 더 나아가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든, 교과서적인 책에 멈추어 그것을 암송하는 데 그쳐선 아직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같은 책을 읽어도 남다르게 읽고 남다르게 사고하는 것, 그리고 그 남다른 차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부로 성공하는 비결이다. 따라서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믿고 시험공부로 출세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나, 반대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그 능력을 믿고 연구자로 나서는 경우 모두 불행한 결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책을 잘 읽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고 아주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최근에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진작하기 위해 ‘독서능력검정시험’을 만들겠다는 제안에 어이없는 실소를 터뜨렸다. 시험을 보고, 잘 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독서를 열심히 하리라는 발상. 그것은 결코 책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의 발상이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곤 책을 안 읽어본 사람, 아니 시험공부한 기억말고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발상임이 틀림없다. 시험, 그것은 그토록 재미있는 책도 끔찍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것 아니던가!
게다가 시험을 위한 독서는 다른 책도 동일하게 읽도록 만들고, 새롭고 특이하게 볼 것도 구태의연하고 평범하게 보게 만든다. 그것은 독서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한자능력검정시험’처럼 성공한 경우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한자능력’이 한자의 음훈을 외고 그것의 표준적인 용법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그나마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독서능력이 그와 전혀 다른 것인 한, 거기서의 성공요인은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실패의 요인이 될 것이다. 차이와 특이성이 요구되는 능력을 ‘동일화’의 잣대로 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흙탕물을 밀어내기 위해 공장폐수의 ‘새물결’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그 흙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이진경/ 연구공간 ‘수유 + 너머’ 연구원·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