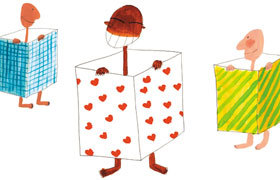이른바 ‘인디언’들이나 남태평양의 ‘미개인’들이 선물의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가령 트로브리얀드 제도의 원주민들은 A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A에게 답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인 C에게 선물을 하는 방식으로 답례한다. 그걸 받은 C는 다시 D에게 주어야 한다. 선물이 선물을 낳는 선물의 증식이 발생한다. 수많은 섬들을 통과하던 선물의 흐름은 돌고 돌아 다시 A에게 돌아갈 것이다. 선물의 커다란 원환이 그려진 셈이다. 모두가 선물을 했고, 또 모두가 선물을 받은 것이다.
또 하나 유명한 선물게임은 ‘포틀래취’라고 알려진 것이다. 그 게임에선 선물을 받으면 그보다 더 많은 선물로 답례해야 한다. 그렇게 답례하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최종적인 승자는 남들이 더이상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 승자가 대개는 부족의 추장이 된다. 뒤집어 말하면, 추장이 되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른 이들에게 선물해야 한다.
이들만큼이나 우리도 수많은 선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선물을 사고 그것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런데 쿨라와 달리 우리의 선물은 대개 대칭적이다. 주는 사람에게만 답례한다. 심지어 주고받는 선물의 ‘가치’를 어느새 비교하기도 한다. “아니, 난 10만원짜리를 줬는데, 겨우 1만원짜리를 줘?” 선물마저 대등하게 교환해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짜증나는 건 달마다 하나씩 들어서고 있는 선물의 날들이다. 선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다. 초콜릿, 사탕에 이어 과자가 등장했다. 상업적 목적에서 기획된 이 선물게임은 자본과 상업이 선물제도에 선물한 최악의 모욕처럼 보인다. “선물이란 어차피 교환의 일종이야!” 이런 코드에 따라 이젠 모든 선물들이 상업과 교환의 그물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하다.
선물을 교환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보다 선물을 이해하는 나쁜 방법은 없다. 선물에 관한 모스의 유명한 책으로 인해 널리 유포된 이 오해에 따르면, 선물은 받으면 답례해야 하기에 결국 교환의 일종이란 것이다. 그러나 선물을 받고 존경을 주는 것을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게 또 있을까? 이 점에선 차라리 소설가가 더 나은 것 같다. 아들 몰래 10만원을 책상에 놓고 나온 어머니와 그 어머니 몰래 지갑에 10만원을 넣어둔 아들. 이것을 교환으로 본다면 교환의 이득은 0이고, 이들은 하나마나 한 짓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들이나 그 어머니나 1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받았기에 두 사람 모두 20만원의 선물의 이득을 얻은 것이다.
선물과 교환간의 거리의 최대값을 보여주는 경우는, 준다는 생각없이 주는 선물, 혹은 선물이란 생각없이 주어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말한다. 수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은 대기의 선물이고, 시원한 그늘은 나무의 선물이며, 해마다 열리는 옥수수는 대지의 선물이라고. 함께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는 친구, 밥을 해주는 할머니,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이 모두가 ‘위대한 정령’의 선물이라고. 선물이 의무라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 물을 것이다. “나는 과연 나에게 선물인 다른 이들에게, 숲의 나무들과 그 나무 사이로 오가는 동물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는가?”
모든 존재자가 선물이 되는 세계, 그게 어디 인디언들만 꿈꾸던 세계였을까? 나의 삶이 나를 둘러싼 타자들의 선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타자들에 대한 선물이 되는 세계. 그러나 우린 이미 그걸 꿈꾸는 것조차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런데 정말 그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두터운 벽 속에선 불가능한 세계인 것일까?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도시의 도로 위에선 정말 불가능한 세계인 것일까? 정작 문제는 불가능한 생각이란 생각, 꿈을 잃어버린 꿈, 그리고 스스로 감아버린 눈은 아닐까? ‘삶’을 뜻하는 제목의 영화 <이키루>에서 구로사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가 실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인지 보여주려는 것 같다.이진경/ 연구공간 ‘수유 + 너머’ 연구원·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