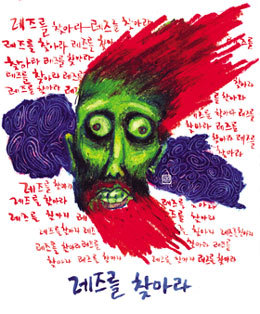얼마 전 <조선일보>의 이한우 논설위원이 “송두율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학계의 선배를 대하는 이한우 학동의 깍듯한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감동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버거운 감동의 덩어리를 이 지면에 덜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문제의 편지에서 이한우 논설위원은 송두율씨를 ‘선배’라 불렀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뮌스터대학 임시교수”는 “1년짜리 시간강사로 불리는 겸임교수”에 가깝기 때문에 교수라 불러드릴 수 없다는 거다. 그 어렵다는 교수자격시험을 통과한 이가 ‘교수’라 불리는 게 그토록 아니꼬우면 그냥 ‘강사’라 부를 일. 그 많은 호칭 중에 왜 하필 ‘선배’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난삽하게 이 책 저 책 번역도 하니까, 자기도 학계에 속한다고 착각한 걸까?
언젠가 그는 모교의 스승인 최장집의 사상을 검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 그를 강모 교수가 “스승의 등 뒤에 칼침을 꽂았다”고 걸쭉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 일로 명예훼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한우 제자는 ‘학과가 다르다’는 이유에서 최 교수를 제 스승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섬세한 구분을 고수하던 그가 출신학교의 차이도 무시하고 송 교수를 ‘선배’라 부르고 싶어진 이유가 뭘까?
그는 ‘선배’의 내재적 접근법이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선언한다. 무식하면 용감한 모양이다. 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명제(正)는 이제까지 외재적 접근법이었다. 여기에 송두율은 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안티테제(反)를 제시한 것이다. 아마도 진리는 두 접근법의 적절한 결합(合)에 있을 게다. 하지만 이한우 후배의 입장은 어떤가? 이중에서 가장 낡은 입장, 그것도 가장 조악한 형태의 외재적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차라리 <조선일보> 수준의 외재적 접근법이다. 학문은 본디 단죄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 내재적 접근은 북을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단죄만 해온 우리의 짝눈을 교정하기 위해 제시된 또 하나의 눈이다. 이 접근법 역시 언젠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나, 그 극복의 길은 그 접근법의 합리적 핵심을 적극 흡수하는 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북한 이해는 다시 <월간조선>과 <한국논단>, 한마디로 저 바닥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재적 접근법은 자칫 체제 정당화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근데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건 정작 <조선일보>다. 언젠가 <조선일보>에서 연재한 박정희 전기. 거기서 조갑제씨는 한국의 인권 개념은 서구와 다르기에, 서구식 인권 개념을 남한에 적용시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은 ‘밥’, 따라서 우리에게 ‘밥’ 먹여준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인권사상가라고 했다. 이렇게 내재적 접근법이 망발을 부릴 때 우리 이한우 후배는 뭐하고 있었나?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선배’는 적어도 북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책을 내지는 않았다. 반면 ‘후배’는 어떤가?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펴낸 데뷔작이 바로 독재자 이승만을 “거대한 나무”라고 찬양하는 책이 아니던가. 독재자를 옹호하던 이 내재적 접근의 명저를 벌써 잊었는가? 아무리 학계에서 인정 못 받고, 독자에게 외면당한 책이라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책도 도서관 후미진 곳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저자의 소행을 증언하러 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이한우 후배는 이렇게 야박한 이가 아니었다. “친일파들의 고민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성숙함을 갖춰야 한다”며, 민족을 팔아 저 혼자 잘 먹고살았던 쓰레기들까지 인간적으로 끌어안고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다감한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가 두개의 조국을 끌어안으려다 온갖 고초를 겪은 이에게, 그것도 자기가 ‘선배’라 느끼는 이에게, 왜 이리 못되게 구는 걸까? 다감했던 그의 인성이 날로 피폐해지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이다.
편지의 말미에서 철없는 후배는 묻는다. “송 선배, 고국에서 보낸 지난 며칠간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망명을 떠나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까?” 후배는 선배가 “지난 며칠간”을 “고국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국정원 조사실이 어디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주는 곳이던가? 고국이 그리워 돌아온 이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나라”. 나 같으면 미련없이 “다시 망명”간다. 진중권/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