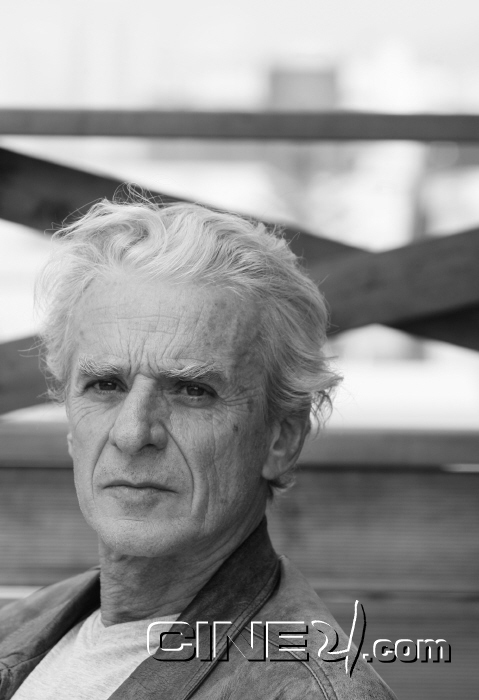브라질의 낯선 영화 <혼돈의 땅>은 한때 브라질 매스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한 인디오 카라피루의 실화를 다큐멘터리처럼 재구성한 영화다. 1977년, 한 인디오 부족이 백인들의 ‘사냥’으로 몰살당하고, 홀로 생존한 카라피루는 그후 10년 동안 혼자 여행하며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다가 20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한다. 그곳에서 옷을 걸치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게 된 카라피루의 이야기는 인류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따라 도시로 간 카라피루는 학살의 날 잃은 줄 알았던 아들과 기적적으로 조우한다. 미디어는 이들의 미담을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혼돈의 땅>은 문명에 적응해 가는 카라피루의 변화를 브라질이 앓는 근대화의 격변과 나란히 관찰한다. 안드레아 토나치 감독에게 인디오 카라피루는 반성 없는 근대화의 폭력에 희생당한 만인의 초상이기도 했다.
-영화의 모든 장면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재연된 픽션이라니 놀랍다. 특히 카라피루가 처음 문명의 마을 사람들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픽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자연스러웠다. =운이 좋았다. 물론 시골의 촌로들이 연기를 해봤을 리가 없다. 그 장면은 카라피루가 그 마을을 떠난지 십수년 만에 다시 찾아가 찍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와의 행복한 시간을 재현할 수 있었던 건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는 아주 쉽게 다큐멘터리와 같은 장면을 얻을 수 있었다. 카라피루와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카라피루의 이야기엔 왜 끌렸나. =처음 그 사연을 들은 건 1993년이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끌린 건 좀 개인적인 차원이다. 당시 나는 가족, 특히 어린 아들과 떨어져 정서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남자가 기적처럼 아들과 조우한 이야기에서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찾아온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 이 영화는 좀더 보편적인 휴머니티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성과 전통이 파괴당하는 지금, 그가 겪은 일과 브라질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이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카메라에 담긴 카라피루의 모습에서 그에 대한 당신의 애정이 느껴졌다. =영화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카라피루가 별종의 생물이 아니라 우리와 꼭 같은 친근한 존재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언어도 생활양식도 다 다르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묻고 싶었던 것이다. 왜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건가. 영화에서 봤겠지만 밀림에서의 그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건 폭력이다.
-결말 부분에서 카라피루는 결국 도시를 떠나 인디오 구역에 들어가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생존자들을 모아둔 보호 구역이다. 인디오들은 원래 정착하지 않는다. 각기 다른 문화의 인디언들을 한 구역에 몰아넣고 정착 생활을 하게 한 곳이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카라피루는 나의 얼터에고이기도 하다. 내가 현재 브라질의 도시에서 느끼는 것과 그가 그 인디오 보호구역에서 느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10년 동안 브라질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근대 국가의 속도에 대한 관점은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발전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는 급격한 발전과 진보에 대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영화에 인용된 TV 다큐멘터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그들이 카라피루를 대상화하는 태도에 문제를 느꼈다. 미디어의 생리이기도 하다. 내가 처음 영화제에 초청받았을 때도, 매체들은 모두 “왜 카라피루를 데려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난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도 이 영화를 통해 그의 삶에 침입한 건 사실이기에 매우 조심스럽다.
-브라질의 영화 산업 구조에서 이 같은 작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혼돈의 땅>은 공적 자금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브라질엔 기업이 법인세의 3~5% 정도를 영화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법률이 있다. 그게 지금 브라질의 영화 산업이 살아있는 비결이다. 시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나는 별로 상업적인 제도 안에서 작품을 하고 싶진 않다. 내가 아는 것, 느끼는 것으로 작품을 만고 싶기 때문이다. 영화는 사람의 마음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매우 강력한 매체이다. 누군가의 앞에 이미지를 내놓는다는 건 일종의 책임이 따르는 행위로, 이윤의 문제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