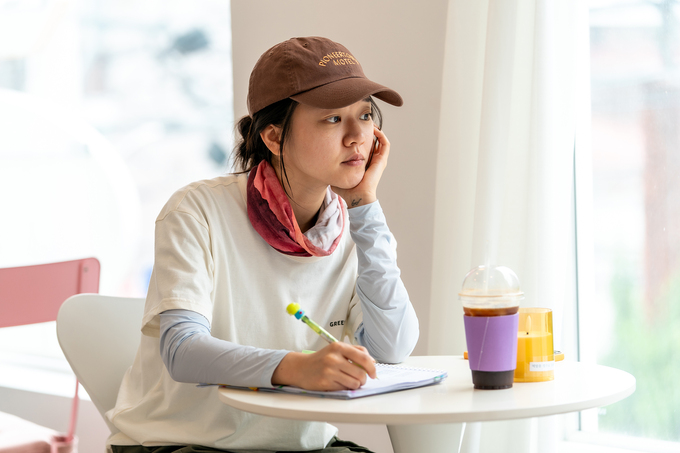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영화 산업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로 선택한 영화가 <극장의 시간들>이란 점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볍게 시작하자면 두 개의 단편을 묶은 앤솔로지 영화의 길이는 62분. 우선 너무 길지 않은 영화라는 점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진지하게는, 동시대 산업의 중심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 감독들이 극장과 영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작품이라는 의미가 마침 절묘히 맞물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전국노래자랑>으로 데뷔한 이종필 감독은 5번째 장편영화인 신작 <파반느>의 개봉을 준비 중이고, 2016년 <우리들>로 데뷔한 윤가은 감독은 신작 <세계의 주인>을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선보인 뒤 바쁘게 부산을 찾았다. 신작 투자와 흥행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화산업의 위기론이 만연한 시기에 단단한 차기작을 완성해 낸 두 감독에게 앤솔로지를 위해 뭉칠 수 있는 타이밍도 마침 겹쳤다. 두 편의 단편은 우선 보기에 그 겉면만큼은 대단히 상이하다.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는 제목 그대로 동물원의 침팬지라는 존재를 불러온다. 2000년 생겨난 어느 극장을 중심으로 영화에 열광하고 침팬지의 존재를 탐구하는 3인조의 시네필 친구들이 세월을 관통하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영영 극장의 운명에 발 묶여 영화감독이 된다.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에선 어린이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를 끌어내고자 분투하는 감독의 부단한 노력이 촬영 현장, 그리고 극장을 오가며 그려진다. <침팬지> 속 침팬지와 우정 서사는 이종필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감독의 실제 경험과 그에 따른 오랜 주제 의식에 천착한 제재이고, <자연스럽게>의 풍경은 실로 우리가 잘 아는 윤가은 감독의 영화와 그 안에 스며든 방법론을 떠올리게 한다. 끈질긴 기억과 고민을 꺼내놓은 감독들의 목소리 역시 마침내 다른 형식과 경로를 거쳐 비슷한 지점에서 만난다. ‘극장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시간, 삶의 시간이다.
두 단편을 감싸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영화전용관인 씨네큐브 25주년을 기념해 씨네큐브 2개관의 영사를 책임지는 홍성희 영사실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다. 올해 76세, 씨네큐브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영사 기사를 이종필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붙었다. 노년의 영사 실장이 보내는 묵묵한 하루 위에 그가 신입 영사기사에 업무를 전수한다는 약간의 설정이 보태졌다.
픽션 안에서 진실이 노출되고 다큐멘터리가 어느덧 픽션으로 흐르는 메타적 시도가 <극장의 시간들>의 몸짓이라면, 그 끝에서 다시 첫 장면의 소리를 떠올려야만 한다. 출발을 앞둔 기차의 소리. 증기 기관차가 열기를 내뿜는 소리가 <극장의 시간들>의 암전을 깨운다. 20일 밤 영화의 전당 <극장의 시간들> 상영 후, 자신의 답변이 '한국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리는 분명 산전수전을 겪은 감독들에게도 적잖이 긴장되는 경험이었을 테다. 현시점에서 영화의 현실은 마냥 영화롭지 않은 데다 두 감독에겐 다시 성적표를 셈해야 하는 장편영화 개봉이 남아있다. 그러나 부산의 무대에서 자신의 출발점을 회고하는 두 감독의 목소리는 의심없이 기억해 냈다. 이종필에겐 “부산국제영화제에 <기쿠지로의 여름>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왔다가 잘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쪽잠을 잤던 때”가, 윤가은에겐 “영화제에 오면 상영관마다 낯선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들과 함께 영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삶이 좀 더 괜찮아지는” 날들이 있었다고.